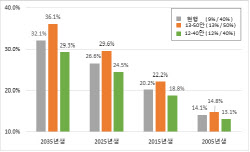올해 94세(1922년생)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은 회사 경영을 언제까지 직접 챙길 것이냐는 주변의 질문을 받으면 늘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
신 총괄 회장이 각종 경영 수치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며 송곳 질문을 쏟아내 보고에 들어간 계열사 대표들을 땀흘리게 만들었다는 일화는 롯데그룹내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얘기도 아니다.
하지만 구순이 넘은 신 총괄 회장의 강한 기업 경영의지가 결국 사단을 만들었다.
신 총괄 회장은 지난해 12월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수억 엔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는 이유로 그를 일본 롯데 주요 임원직에서 모두 해임한다. 회삿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보고도 하지 않았고, 회사에 결국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올해 7월에는 반대로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중국 사업 손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에게 해임카드를 내밀었다.
아버지가 반 년만에 해임카드를 장남과 차남에게 번갈아 주는 사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앞세웠다가 반대로 무시하기도 하며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해임 카드를 먼저 받았던 장남은 석고대죄로 아버지 마음을 다시 얻었으나, 해임 카드를 나중에 받았던 차남은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홀로서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싸움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싸움을 종식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신격호 총괄 회장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신 총괄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나 회사 내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그는 그룹내 부동의 1인자다. 차남 신동빈 회장이 아버지의 해임 지시를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신 회장이 아버지와 정면 대결을 펼쳤을 때 승리를 장담하기는 힘들다.
신 총괄회장은 빈손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대기업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단돈 5만엔을 빌려 오일 공장을 차리고 이후 껌 제조를 통해 일본 제과업계를 평정한 `롯데` 기업을 일군 것은 일본 재계에서도 유명한 얘기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신동빈 회장 역시 한국 롯데그룹 경영을 맡은 지 10년만에 23조원 이던 그룹 매출을 80조원으로 끌어올리며 롯데를 재계 5위 기업으로 키워내 아버지의 경영 능력을 빼다 박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역시 일본 제과업계에서 롯데의 명성을 계속 유지해오는 등 경영성과를 보여줬다.
신 총괄회장이 자신에게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 경영을 잘 해온 두 아들에게 해임카드를 남발하는 사이 롯데그룹은 세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의 민낯이 드러나고 가족 간 경영권을 두고 싸우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자 롯데의 제품과 기업 문화를 좋아했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롯데그룹은 오는 2018년까지 매출 200조원을 달성해 아시아 톱 10 기업으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기업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궁리`한다는 신 총괄 회장이 현재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을 우선 끝내는 것이다. 싸움이 장기화 될 수록 그가 삶처럼 소중히 여겼던 기업 `롯데`의 상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