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면을 끓일 때 면과 수프 중에 무엇을 먼저 넣어야 하는지가 대표적이다. 혹자는 수프를 먼저 넣어야 면을 맛있게 끓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에 수프가 들어가면 입자가 고와져 빨리 세게 끓기 때문이다. 센 불에 끓인 라면이 맛있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쉬 반박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반대로 먼저 면을 끓여야 양념이 잘 밴다는 주장도 있다. 면이 적당하게 불어야 느슨해진 밀가루 입자 사이로 국물이 편하게 스며들어 맛이 배가된다는 것이다.
호각을 다투는 의견 충돌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음식의 맛은 상대적이지만 평가는 절대적이라서 언제나 합리적으로 성립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제조사의 라면끓이는 법은 참고할 만하다. 라면 1등 신라면의 제품 겉면에는 이런 설명이 담겨 있다 ‘물 550ml(3컵 정도)를 끓이고 면과 분말스프, 후레이크를 넣어 4분30초간 더 끓이면 얼큰한 소고기 국물 맛의 신라면이 됩니다.’
면이 스프보다 먼저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글의 맥락에서 읽으면 먼저 넣으라는 설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경쟁사 오뚜기의 진라면은 수프를 먼저 넣으라고 하니 면과 수프의 선후에 `국룰`은 없다.
농심 관계자는 “라면과 스프를 동시에 넣으라는 의미”라며 “맛을 떠나서 스프를 넣으면 물이 부풀어 넘쳐 소비자가 부상할 수 있기에 면을 먼저 넣는 걸 권한다”고 말했다.
여하튼 면과 수프의 `선후전쟁`은 끓는 물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닿아 있다. 끓는 물 라면은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상식을 허무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가 지난 2월 페이스북에서 `라면을 찬물에 끓였더니 맛있더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게 불을 댕겼다. 라면회사가 반박하고 유명인이 따라 하는 과정이 반복하면서 혼돈이 이어졌다.
|
이런 배경에서 찬물 라면은 라면 회사에서 권하지 않는 조리법이다. 식품의 핵심은 균일한 맛을 내는 것인데 찬물 라면은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라면 회사가 표준조리법에서 `끓는 물`을 제시하는 것은 늘 같은 조리 조건을 만들려는 이유에서다.
찬물은 물 온도를 가늠하기 어려워 조리 조건이 항상 제각각이다. 1도이건 10도이건 찬물은 마찬가지인데, 물 온도와 화력에 따라서 조리시간이 좌우되고 이로써 맛에 영향을 준다.
찬물 라면은 라면 회사의 맛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에 달갑지도 않은 존재다. 인간은 예측이 빗나가는 걸 피하려는 성향을 보편적으로 가진다. 하물며 입에 들어가는 식품에는 특히 보수적인 사고를 한다.
농심 관계자는 “표준 조리법은 맛을 내기보다 균일한 맛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라며 “결국 정확한 조리법이 맛의 비결”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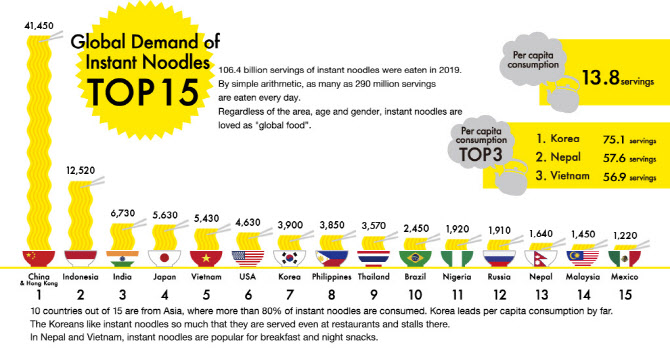




![특종이다, 특종! 빗자루로 교사 때린 학생들, 처벌 대신...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700002t.jpg)
![르세라핌 측 공개석상서 실명 거론 유감 [전문]](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600666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