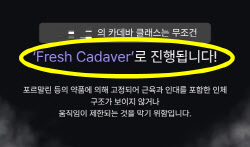|
[이데일리 SPN 정철우기자] 1999년 해체된 쌍방울 레이더스는 이제 추억에서만 살아 있다. 야구로선 척박하기 그지없는 전주연고 구단의 역사를 잇겠다고 나선 기업은 단 한군데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팬들의 기억속엔 아련하게 남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90년대 후반, 회색빛 촌스런 유니폼을 입고 마치 승냥이처럼 상대를 물어뜯던 그들의 공격성은 강인한 인상으로 남아 있다.
또 '기왕이면 불쌍한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우리네 정서는 가난했던 그들의 처절한 싸움을 가슴 아리게 기억하게 한다.
김원형은 그 쌍방울에서 '어린 왕자'로 불리며 가장 긴 세월을 견뎌낸 선수다. 쌍방울과 김원형은 한국 프로야구 1군 데뷔 동기(1991년)이며 쌍방울이 해체되던 해(1999년) 마지막 에이스 역시 김원형이었다.
김원형은 "글쎄, 다른건 잘 모르겠고 전체적인 팀 분위기가 정말 가족같았다. 솔직히 선수 중에 사고 친 선수들도 꽤 많았는데 프런트도 그렇고 감독님들도 그렇고 전부 감싸주려 했었다. 물론 팀 자체적으로는 무거운 징계가 내려졌지만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줬다. 선수들끼리고 참 정겨웠다. 때 되면 같이 놀러도 가고 회식도 자주 하고, 보는 사람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우린 참 즐거운 기억이 많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추억은 원하는 것만 기억하게 해서일까. 가난한 구단의 아픔에 대해선 별다른 감회가 없다고 했다. 다만 지기 싫었다는 기억만 갖고 있었다.
"삼성이나 현대처럼 돈 많은 구단을 보면 부럽다고 생각한 적 없는 것 같다. 대신 저 팀들을 꼭 이겨야겠다는 오기를 갖고 야구했던 것 같다. 김성근 당시 감독님이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드신 것 같기도 하고. 제일 행복했을때야 물론 96년이었다. 창단하고 처음 성적이 나는데 정말 신났다. 내 개인 성적은 별로 안 좋았지만 지는 것이 일이던 팀이 매일 이기니 너무 좋았다. 그땐 관중들도 많았다. 김성근 감독님이 부임하시고 점퍼에도 이름과 배번을 새겨놓도록 하셨었다.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플레이를 하라고 하셨다. 그땐 운동장에 샤워시설이 없어서 점퍼를 입고 숙소나 목욕탕에 가야 했다. 첨엔 너무 창피했다. 하지만 야구를 잘하고 나니 그렇게 즐거울 수 없었다."
다음은 김원형이 뽑은 쌍방울 레이더스의 올타임 올스타 명단과 짧은 선정 이유다.
투수 - 조규제 : 정말 그 당시 최고의 공을 던졌다. 불같은 직구는 명품이었다.
포수 - 박경완 : 그때나 지금이나 최고다.
1루수 - 김기태 : 야구나 생활이나 시원시원했다. 최고의 리더다.
2루수 - 최태원 : 근성의 사나이.
3루수 - 김성래 : 전성기가 지나서 팀에 오셨는데 그 지옥훈련을 다 견디시더라. 실력도 좋았다.
유격수 - 김호 : 티 안나게 잘하는 대표적인 선수다.
좌익수 - 김실 : 테이블 세터로 주로 나갔는데 찬스에 강했다.
중견수 - 조원우 : 공,수,주 모두 빼어났다. 쌍방울 시절 야구에 눈을 떴다. 99년에 고관절 부상만 아니었어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선수다.
우익수 - 심성보 : 어깨는 내가 본 외야수 중 단연 최강이다. 방망이도 잘 쳤다.
▶ 관련기사 ◀
☞김원형이 말하는 '친구 박경완 이야기'
☞[달인에게 묻는다Ⅱ]김원형의 '평범한' 에이스가 사는 법


![“여기 살면 생명도 무허가인가요”.. 장마가 두려운 판자촌[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1000989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