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산대 재학생은 2016년 한때 3000여명에 달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2015년 법인 이사장·사무국장이 80억원의 교비를 횡령하면서 재정난을 겪다 지난해 8월 교육부로부터 폐교처분을 받았다. 2000년대 이후 문을 닫은 전문대학은 성화대(2012년)·벽성대(2014년)·대구미래대(2018년)·서해대(2021년)를 포함 5곳이다.
지난달 23일 찾은 동부산대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긴 흔적이 곳곳에 뚜렷했다. 쇠사슬로 굳게 잠긴 문 안쪽에는 먼지가 쌓인 채 밀려난 집기들이 가득했다. 과자·음료수 등으로 가득했을 매점도 텅비어 있었다. 학생 한명 찾을 수 없는 운동장에는 바람에 낙엽만 뒹굴고 있었다. 본관 입구 누군가 가져다 놓은 고양이 밥그릇만 이곳에 사람이 다녀갔다는 걸 알게 했다.
|
어렵게 연락이 닿은 동부산대 전 교직원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취업도 불가능해 다들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2년 정도 못 받은 임금이 1억이 넘는다. 1년·2년씩 급여가 안 나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나”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법인이나 교육부에서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는다”면서 “학교를 회생시키려고 노력한 죄밖에 없는데 생계도 못 꾸리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재학생 444명과 휴학생 317명, 재적생 761명은 대부분 인근 대학으로 특별편입했다. 대학이 폐교되면 교육부는 학생들의 편입학은 지원하지만 교직원 고용승계를 보장하진 않는다. 법인 관계자는 “작년 8월 학생 대부분이 특별편입을 통해 인근 대학으로 편입했다”며 “괜찮은 대학·학과로의 편입을 기대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학교에 계속 남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활도예과 같은 경우 장애인반이 있었는데 인근 대학으로 편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 근방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 멀리 이동하기 어려워 하는 학생들도 있어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
인근 식당 사장 김모(64)씨는 “학생들이 없으니 생계가 어려워 90% 이상의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며 “주민 단골이 있거나 자기건물이 아니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부산서점도 학교설립부터 40년 이상 운영했는데 문을 닫았다”며 “예전에는 당구장, PC방, 술집, 식당 등이 많았는데 이제는 학생들과 상관없는 상점만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점심시간에도 손님 한명 없이 텅빈 분식집도 있었다. 사장 박모(74세)씨는 “오늘 손님을 3명 받았다. 학생들이 많았을 때는 20명도 받았는데…나이가 들어 소일거리 삼아 운영하고 있지만 전기세, 가스비도 안 나온다”고 말했다.
동부산대는 지하철 노선에서도 이름이 지워진 첫번째 대학이 됐다. 부산교통공사는 4호선 ‘동부산대역’을 ‘윗반송역’으로 바꿨다. 폐교한 학교 이름이 역명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학생 모집난을 겪는 지방대 입장에서 동부산대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지방대 충원난이 심화되면서 제2·제3의 동부산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한 지방대 교직원은 “지방에서 나름 인기가 많았던 대학들도 미달이 나고 있다. 지방대 폐교는 몇 년 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절반가량의 대학이 사라져야 수급 균형을 이룬다는데 사라지는 대학의 교직원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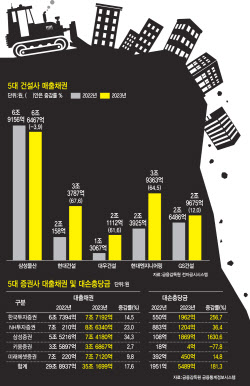


![“도와주세요!” 한마디에…폭행당하던 택시기사 구한 알바생 [따전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160050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