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학회장은 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제외하고서는 게임중독과 관련해서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어느 국가에서도 의사들이 조직화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곳은 없다”면서 “정말 게임중독이 심각한 문제라면 전 세계 게임협회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내듯 전 세계 의학계도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2013년 의사 출신의 신의진 의원을 앞세워 4대중독법을 추진하다 좌초되자 같은 해 모 의대 교수가 직접 WHO에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중독학회 내부공지에 숙원사업이라고 표현한 것부터 과거 WHO 사무총장이 모 아시아국가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발언한 것 등 순수성을 의심할 정황은 넘치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게임중독의 질병코드화와 관련한 전 세계 논문 674건 중 가장 많은 91건이 국내 의약학 분야에서 발표됐고 이들 대부분이 게임중독 자체를 ‘일단 전제하거나 동의한 상태에서’ 진행한 연구들이다.
위 학회장은 아울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과잉 의료화와 ‘병팔이(병을 만들어 약을 파는 자를 지칭하는 말)’의 난립을 우려했다. 그는 “게임 과용에 관련한 행동 문제를 질병으로 분류하면 새로운 치료(진단 및 상담)와 예방시장이 열린다”며 “상담사의 영역이 이제 의사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게임중독자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1%의 환자만 늘려도 60만명의 신규 환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 중독의 질병코드화가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학계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 체계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위 학회장은 학회 자문변호사의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합법적인 게임물에 대해서도 부담금관리법 제3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및 제14조의2 법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과 수수료 등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원인 제공자의 책임과 자정의 노력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위 학회장은 “20년 넘는 한국 인터넷게임산업 역사에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1차적으로 업체들 책임”이라며 “그동안 성장만 추구했을 뿐 게임을 적대시하는 부모세대를 설득하거나 하는 등의 노력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게임의 유해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절반의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이유를 깨닫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사태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문화로서의 게임을 퍼뜨리는 자정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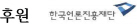
![노래방 도우미에 빠진 공무원 남편 어떡하죠[양친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700021t.jpg)


![휴가 중 기내서 심정지 환자 발견…CPR로 살린 교도관 [따전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70015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