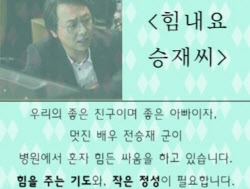대한 독립을 위해 싸웠던 이들이 남긴 ‘항일·독립 문화유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국가의 보존과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천장이 무너지거나 주차장이 들어서며 사라진 곳도 부지기수다.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돼야 제대로 된 보존과 관리를 받을 수 있지만,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항일·독립운동 문화유산’의 수는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례는 부지기수다.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었던 강원도 춘천의 윤희순 선생의 생가는 건물 외벽 곳곳이 갈라지거나 떨어졌다. 유적지 관리는 후손인 유모씨가 누구의 도움없이 혼자 하고 있다. 경남 진주에서 만세운동을 지휘한 김재화 선생의 생가는 시멘트 벽면 등으로 개보수해 원형이 훼손됐다. 현재는 김재화 선생과 관련 없는 마을 주민이 살고 있다. 1919년 경기도 수원군 장안면과 우정면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지휘한 차병혁 선생이 살던 집도 마찬가지다. 안채는 재건축됐고, 현재는 행랑채만 남았다.
|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2023 국가유산 연감’에 따르면 현재 국가지정문화유산은 국보 354건, 보물 2351건, 사적 526건 등을 포함해 총 4300건이 지정돼 있다. 이 중 ‘항일·독립 문화유산’은 국보 0건, 보물 41건, 사적 7건, 근대사적 5건 등 총 53건에 불과하다. 전체 비율로 보자면 1.2%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근 5년간의 지정건수를 살펴봐도 2019년 1건(근대사적), 2020년 2건(보물), 2021년 3건(보물), 2022년 6건(보물), 그리고 2023에는 0건으로 총 12건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기록은 후세를 위해서라도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유산이다. 일제의 만행을 현재 시점에서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고 교육적·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전성현 동아대 사학과 교수는 “시간적인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 많은 항일 문화유산이 국보나 보물의 등급까지 올라가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국가유산의 범주를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서 더 많은 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항일·독립 문화유산’의 지정비율이 낮은 이유는 기존 문화유산 정책에서 시간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 영향이 크다. 최소한 50년 이상이 돼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중에서도 국보의 경우 100년 이상 된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일제강점기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라는 것을 고려해도 상대적으로 근대시기의 유산은 지정에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 일제시대 이후 ‘항일·독립 문화유산’은 가장 오래된 것이 고작 114년이다.
|
‘항일·독립 문화유산’의 경우 원본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다. 건축문화재의 경우 오랜 세월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보존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그에 반해 항일 문화유산은 불에 타다 남았거나, 담이 무너지는 등 저항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항일의지를 드러내며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를 먹으로 덧칠한 ‘진관사 태극기’가 그 예다. 비록 ‘보물’로 지정돼 있지만, 윗면이 불에 타 손상된 흔적과 구멍이 곳곳에 남아 있다.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항일·독립 문화유산’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현재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지 정확하게 집계된 바는 없다. 자체적으로 항일 유적을 조사하고 있는 지역들도 항일 문화유산 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실태를 파악해야 할 문화재청은 “항일독립문화유산 발굴·지정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2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 제도가 시행됐다.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과 활용을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정·관리하는 문화재로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사적 등)과는 다르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항일·독립 문화유산’ 중에서는 145건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이 제도에 따라 당진 ‘소난지도 의병총’과 애국지사 8인의 묘지가 있는 ‘망우 독립지사 묘역’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돼 보존과 관리를 받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일·독립 문화유산을 유형별로 분류해 적극적으로 발굴·등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항일·독립운동이 전개됐던 현장 공간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경기도의 경우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유물 7700건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학계와 정부 부처 간의 협력도 중요하다. 현재는 독립기념관과 국가보훈처 등 부처별로 각각 관리를 하고 있어 통합적인 정보를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 박경목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는 “정기적으로 소장유물 등에 관한 협력조사를 해서 문화재적 가치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라며 “5년 단위 등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





![[속보]뉴욕증시, 약보합 마감…다우 장중 4만선 돌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1700015t.jpg)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1700004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