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주헌 미술평론가] 독일의 수학자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1777∼1855)의 어릴 적 일화다.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1부터 100까지 전부 더하라는 문제를 냈다. 다들 하나씩 더하며 끙끙거리고 있는데, 소년 가우스는 몇 초 만에 문제를 풀었다. 선생님이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계산했느냐고 물으니, 자신이 푼 방법을 설명했다. 0+100, 1+99, 2+98, 3+97 … 49+51, 이렇게 합계 100이 50쌍 나와서 5000, 거기에 홀로 남은 50을 더하니 5050이 됐다는 것이다. 문제 안에 합계 100이 되는 숫자들의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물론 1+100, 2+99 … 50+51의 수식으로 101을 50개 만드는 패턴을 찾아 5050을 구할 수도 있다), 이를 활용해 쉽게 문제를 푼 것이다. 이처럼 패턴인식이 뛰어나면 사물이나 현상의 숨은 질서를 파악하고 문제를 빨리,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 혁신을 이룰 수 있다.
△돌덩이에 ‘모눈’ 그린 이집트 조각가들
고대 이집트 문명은 엄청나게 많은 조각상을 문화유산으로 남겼다. 이집트 조각가들은 다른 고대문명의 조각가들에 비해 매우 혁신적인 방식으로 조각작품을 제작했다. 이 또한 그들의 패턴인식이 남달랐기 때문이었다.
생각해 보자. 큰 돌이 있다. 이것을 쪼아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어느 방향에서 봐도 결함이 없는 형상을 만들 수 있을까. 입체작품을 만드는 것은 평면작품을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르다. 앞면에서 돌을 열심히 쪼아 얼굴이 잘 나온 것처럼 보여도, 옆에서 보면 코가 납작하거나 입술이 너무 튀어나와 있을 수 있다. 게다가 돌을 지나치게 쪼면 거기서 끝이다. 깎인 돌은 다시 붙일 수 없다. 모든 게 처음부터 착착 맞아 들어가야 한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집트 조각가들은 매우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먼저 돌을 직육면체의 기둥 형태로 깎았다. 그리고 앞·뒤·좌·우 네 면에 ‘그리드’(grid), 곧 모눈을 그렸다. 그래프용지를 생각하면 된다. 그 위에 사람의 앞·뒤·좌·우의 모습을 해당 면에 하나씩 동일 비율로 그렸다. 이렇게 한 뒤 모눈상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나갔다. 그렇게 각 방향에서 파 들어가면 서로 만나는 부분에서 계획했던 형상이 드러났다.
그렇게 만들어진 석조입상 ‘파라오 멘카우라와 그의 왕비’(기원전 2490~2472년경)는 매우 박진감이 넘친다. 형태와 비례, 구성 모두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라 모순이나 비약이 없고 정교한 인상을 준다. 고대의 조각이지만 지성미가 물씬 풍기는 것이다.
이 혁신적인 조각형식은 이집트 미술의 드높은 성취를 견인했을 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도 전파돼 서양조각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 멋진 그리스의 대리석 조각들은 바로 이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이 방식이 사실적인 형태나 복잡하고 역동적인 형상을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오늘날 3D 컴퓨터그래픽 형상을 만들 때 수많은 선으로 물체의 윤곽을 표현하는 ‘와이어프레임 모델’도 본질적으로는 이집트의 그리드 형식으로부터 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학조사, ‘패턴’ 발견해 질병 분포양상·원인 밝히는 것
이집트인들은 이 같은 조형방식을 회화에도 똑같이 적용했다. 우리나라의 무용총 벽화에서 볼 수 있듯 대부분의 고대 고분벽화는 손가는 대로 긋는 ‘프리핸드’(freehand) 형식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이집트 고분벽화는 모눈 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상을 그리는 제도(製圖)적 형식으로 제작됐다. 그래서 회화도 조각처럼 매우 정교하고 정연한 인상을 준다.
|
이집트 회화의 그리드는, 중왕국 12왕조(기원전 1991~1782년)를 기준으로 보면 가로 7칸, 세로 18칸의 모눈이 인체입상을 그릴 때 요구되는 표준이었다. 이 모눈 위에 입상을 그리면, 무릎 선은 맨 밑에서 6번째 칸에, 엉덩이 아랫부분은 9번째 칸에, 팔꿈치는 12번째 칸에 와야 했다. 이렇게 형상의 크기와 비례, 자세와 동작 등 모든 것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패턴화해 처리했다. 이 패턴은 화가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었다(이는 조각도 마찬가지였다). 이로 인해 숙련된 화공이 그리면 누가 그려도 거의 같은 스타일의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었다.
왜 이집트인들은 다른 고대문명과는 다른, 이처럼 고도로 패턴화한 조형형식을 추구하게 된 걸까. 이와 관련해서는 패턴이 지닌 본질적 특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역학조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역학조사도 일종의 패턴연구다. 현대역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 의사 존 스노(1813∼1858)는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하자 환자들의 집을 지도에 표시했다. 그러자 특정 지역에 환자가 몰리는 패턴이 나타났다. 그 지역의 물 펌프에서 물을 길어 먹은 사람들 사이에서 콜레라가 발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멀리 살아도 그 물을 길어 먹은 사람들은 병에 걸렸고, 가까이 있어도 자체 펌프가 있던 공장의 직원들은 병에 걸리지 않았다. 콜레라가 수인성 전염병이란 사실을 이로써 알아챌 수 있었다. 이처럼 역학은 패턴을 발견해 질병의 분포양상과 그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세계시장 장악한 신생기업의 비결은…
패턴은 이렇듯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아도 근저·맥락 속에 자리 잡은 사물과 사건의 질서와 규칙을 드러내준다. 선구적인 고대문명을 이룬 이집트인들은 바로 세계의 이런 규칙성에 매료됐고, 그 규칙성을 조형예술작품을 통해 적극적으로 표출했다. 그래서 모눈에 대상을 패턴화해 표현하는, 당시로서는 매우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조형적 업적을 이뤄냈다. 바로 그 성취로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완벽하고 영원한 규칙의 세계, 곧 신들이 주재하는 이상세계를 은유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어떤 현상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은 결국 그 현상의 본질이나 구조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탈레스 테이셰이라 교수는 우버·에어비앤비·넷플릭스·아마존·트립어드바이저 등의 신생기업이 시장을 장악해가는 데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테이셰이라는 이를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말한다.
테이셰이라에 따르면, 과거에는 고객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구입해 사용하기까지 기업이 제공하는 일관된 ‘검색-구입-사용’ 체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이제는 검색 따로, 구입 따로, 사용 따로인 ‘따로국밥’의 시대가 됐다고 한다. 혁신적인 신생기업들은 이 흐름의 약한 고리를 끊고 이를 자기 시장으로 잠식해버린다. 그게 디커플링 현상이다.
이를테면 고객은 초대형 가전업체 매장에 들어가 상품을 열심히 살펴보고 거기서 상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마켓에서 상품을 사버린다. 구입의 고리가 끊어진 것이다. 기존 기업들은 자신들의 위기가 기술혁신 혹은 디지털혁신이 뒤진 데서 왔다고 봤지만, 이는 시장변화의 구조적 패턴을 잘 보지 못한 데 따른 것이었다. 고객친화적으로 나간 신생기업들은 검색이면 검색, 구입이면 구입, 사용이면 사용 등 어느 하나에 집중해 기존 기업들의 약한 고리를 끊는 패턴을 보였다. 이렇게 패턴을 본 기업과 보지 못한 기업 사이에는 명암이 엇갈렸다.
이집트 미술이 보여주듯 패턴을 보는 것은 현상에 내재한 질서와 규칙을 보는 것이다. 혁신은 현상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내재한 질서와 규칙에 대한 대응에서 나온다. 그래서 패턴을 찾고 패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집트 미술가들은 그렇게 혁신을 이뤘다.
△이주헌 미술평론가는…
미술로 삶을 보고 세상을 읽는다. 좀 더 많은 이들이 미술을 통해 일상의 풍요를 누리도록 글 쓰고 강연하는 일이다. 소명으로 여긴다고 했다. 발단이 있다. 홍익대 미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뒤 돌연 일간지 기자가 되면서다. 그림에 관심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림을 막은 생계 때문이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그리자 했다. 하지만 ‘투잡’은 쉽지 않았다. 미술담당 기자생활에서 얻은 필력과 생각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왔다. 미술을 대중과 제대로 연결하는 미술평론가의 ‘진정한’ 역할, 그것을 해보자 했다. 그렇게 가나아트 편집장을 하고, 학고재 관장을 오래 한 뒤 서울미술관 초대관장까지 지냈다. 지금은 양현재단 이사로 있으면서 온전히 글과 강연에만 집중하고 있다. 지은 책이 수십 권이다. 굳이 대표작을 꼽자면 ‘리더의 명화수업’(2018), ‘역사의 미술관’(2011), ‘지식의 미술관’(2009), ‘50일간의 유럽미술관 체험 1·2’(2005)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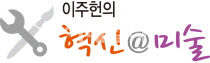



![국민 10명 중 7명 尹 탄핵 찬성…부산·대구에서도 60% 이상[리얼미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50035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