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을 하고 숨을 쉬는 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후두는 성대를 포함한 목소리 상자라 할 수 있다.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보면 튀어나온 부분으로 이곳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 ‘후두암’이다.
◇후두암, 담배 피는 남성에 많이 발생
40~60대에서 많이 발병하는 후두암은 머리에서 가슴 윗부분까지 발생하는 두경부암 중 가장 흔한 암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5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갑상선암을 제외한 두경부암 환자는 총 4455명으로 전체 암환자(21만 4701명) 중 2.1%를 차지했다. 이중 후두암 환자는 1146명이었다. 두경부암 환자 4명 중 1명 꼴이다.
다만 고무적인 사실은 후두암 발병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99년 암 등록통계를 실시한 이후 후두암 발병자 수는 연평균 0.38% 증가했다. 이는 △유방암(7.56%) △대장암(6.55%) △위암(2.12%) △간암(1.11%) 등 주요 암 발병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특히 후두암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이 발병한다. 현재 국내 후두암 유병자수는 약 1만명으로 이 중 9400명 정도가 남성이다. 이렇게 남성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후두암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흡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흡연에 대한 인식 변화로 국내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남성 흡연율(32.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로 상위권을 이어가고 있다.
◇조기 발견시 완치 가능
홍현준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최근에는 여성 흡연율이 증가하면서 여성들의 후두암 발병률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후두암은 원인이 분명한 만큼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그 시작은 금연”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흡연자가 금연을 하면 6년 후 후두암 발병률이 낮아지고, 15년 후 비흡연자와 비슷해진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음주’도 후두암의 직접적인 발생 인자로 작용한다. 특히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즐기는 사람은 흡연과 음주 중 한 가지만 즐기는 사람에 비해 후두암 발병률이 2~3배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후두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 △성문암(성대에 발생한 암) △성문상부암(성대 윗부분에서 발생한 암) △성문하부암(성대 아래 부분에서 발생한 암)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발생부위 및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증상에 차이가 있다. 성문암은 음성의 변화라는 초기 증상이 있다. 따라서 다른 부위의 암에 비해 초기에 발견하기 쉽다. 반대로 이를 방치할 경우 음성은 가벼운 쉰 소리에서 점점 나빠져 급기야는 소리가 나지 않거나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성문상부암은 음성의 변화보다는 초기 증상으로 후두의 이물감·불쾌감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음식물을 삼킬 때 귀와 목으로 통증이 퍼지는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방치해 암이 진행할수록 통증이 증가하며 종양이 성대를 침범하면 음성의 변화가 동반된다.
성문하부암의 초기 증상은 호흡곤란이다. 마찬가지로 종양이 성대를 침범했을 때 쉰 소리가 난다. 이렇듯 후두암은 증상이 바로 나타나 조기 발견이 가능하고, 암의 림프절 전이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후두를 감싸는 연골 때문에 악성 종양이 잘 퍼지지 않아 조기 성문암은 100%에 가까운 완치율을 보인다.
홍현준 교수는 “후두암 치료에 있어 중요한 것은 성대의 보존 여부인데, 그 가능성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높아진다”며 “목소리 변화와 이물감, 목에 혹이 만져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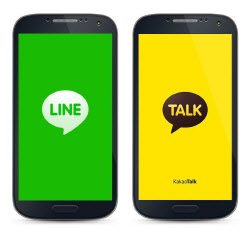
![트러플 ‘0.0000007%' 함유, 정말 넣긴 하니? 그 진실은[궁즉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10086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