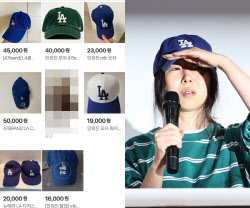|
[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장사꾼이 장사를 잘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팔릴 만한 물건이 없거나 팔아낼 판을 못 벌렸거나. 모르긴 몰라도 둘 중 하나가 패인일 확률이 50% 이상일 거다. 원색 비난을 거둬내고 좀더 그럴듯하게 다듬으면 이쯤 될 거다. 차별화할 콘텐츠가 없거나 시장트렌드를 놓쳤거나. 상품성도 없고 경쟁력도 없고. 분석력도 없고 속도감도 없고. 이런 처지라면 보통 두세 가지 여건도 두루 구비하고 있을 터. “얼마를 벌지 정한 적이 없다. 그냥 많이 벌었으면.” “물론 열심히 한다. 앉아서 검색하고, 앉아서 인맥을 키우고.” “SNS에서 남들이 하는 건 빠짐없이 훔쳐본다. 부럽긴 하지만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대단한 요인이란 건 어차피 없다. 동네 마트든, 세계 굴지의 기업이든 시작은 여기니까. 내 물건 남에게 팔기. 결국 별다를 게 없는 그 일에 어찌 백 가지, 천 가지의 성적이 나오는가. 그런데 이 사람의 논리라면 쉽게 풀릴 듯도 하다. 그 답이 전적으로 ‘고객’에 있다니까. 손님은 손님인데 목적이 있는 손님, ‘봉’도 ‘왕’도 아닌 그저 내 물건을 사주는 대상인 그 고객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라니까. e커머스(전자상거래) 전문컨설턴트로 이름을 알린 저자의 생각이 그렇다.
장사가 뭐길래 저자는 고객과의 관계에 ‘운명’까지 들먹이나. 그저 팔고 사는 일 이상의 관계여야 한다는 의미일 거다. 운명의 상대가 느끼는 결핍·두려움·욕구까지 찾아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란다. 상품을 내주고 서비스를 파는 데서 나아가 팬덤·팬심까지 구축하란다. 구체적으론 팬클럽 멤버 수까지 가늠했다. 1000명. 그 정도면 어떤 사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이런 역설을 이해하려면 저자의 사연을 먼저 들어볼 필요가 있다. 10여년을 벤처기업에서 죽을힘 다해 일했단다. 그럼에도 가세를 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안되더란다. ‘돈 만드는 자’가 되자고 결심하고 37만 5200원을 들고 서울로 입성한 게 2006년. 수제화의 메카 성수동에 무작정 찾아갔다. 그러곤 3년 모텔 생활을 견뎌낸 끝에 드디어 ‘수제화 온라인 도매사업’에 성공했다. 그뿐인가. 한 의류쇼핑몰의 전문경영인이던 2009년엔 신화창조까지 이뤄냈다. 하루매출 500만원을 1억원으로 키운 거다. 단 10개월 만에. 그런데 그가 목숨을 걸었던 건 ‘돈’만이 아니었던 거 같다. 사람이 보인다. 의류·잡화·주얼리·코스메틱·침구·가구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섭렵하며 쌓은 인맥을 자랑한다. e커머스 분야에서 경영·마케팅 컨설턴트로서 기반을 다지게 한 실질적인 조건이자 기둥이었던 셈이니 그럴 만도 하다.
|
책은 시종일관 조곤조곤 이르는 식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옛이야기를 옆에서 풀어놓는 듯하다. e커머스 전문가라 하지만 굳이 온라인시장에만 국한하지도 않는다. 덕분에 읽어내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쉽지 않은 건 역시 ‘내 생각’을 뒤집는 일. 가령 ‘장사나 사업이 사람을 남기는 일’이란 상식적인 접근에도 저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데. 자신에게 유리한 관계로 고객을 만들지 말고 그에게 유리한 관계로 자신을 만들어내라 이르는 거다. 하지만 한계는 있다. 어차피 친목을 도모하고 마는 사이가 아니니까. 결국 상품이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팔 것을 내밀고, 광고도 하고, 지갑을 열게 하고, 입소문이 나게 하고. 바로 상품과 모객, 접객과 고객관리로 순환하는 돈의 흐름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고객이 막연한 추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다. 사실 ‘업’이란 게 그렇지 않나. 토질을 확인하고 땅을 가꾸고 무엇을 심어낼지를 파악한 뒤에 씨를 뿌리는 게 순서다. 상품도 마찬가지다. 물건이 안 팔린다? 그걸 어찌 알겠느냐는 거다. 왜 샀는지는 자랑해도 왜 사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구태여 입을 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 안 팔리는 이유를, 불확실성을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다. 차라리 팔리는 상품, 확실성을 파악해 그 상품이 또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나은 대처란 말이다.
판매의 절대조건으로 꼽히는 가격, 온라인시장이라면 흔히 떠올리는 ‘저가정책’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단다. 가격경쟁전략이란 건 죽을 위기에 마지막으로 써야 하는 비장의 카드란 거다. 적절한 세일이라면 먹힐 수 있겠으나 저가전략이란 건 이미 비생산성을 깔고 들어가는 작업일 뿐이라 지적한다. 모바일 비중에도 신경을 써야 할 때란다. 광고·홍보비용의 투자비율, 매출의 발생비율이 모바일에서 60%를 못 넘긴다면 ‘서서히 망해가는 중’을 확신한다고 했다.
△상품을 사는 건 돈이 아닌 사람
구비구비 돌아왔지만 결론은 이거다. ‘돈이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상품을 산다.’ 만약 ‘가진 자가 유리한 세상’이란 법칙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방법은 하나뿐. 사는 사람이 아닌, 파는 사람이 가진 자가 되면 된단다. 이렇게 되면 영원한 불평등관계로 여겼던 숙제가 저절로 풀린다. 상품을 팔지 못해 매달리는 사람에 가했던 부담이 상품을 구하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사람에게로 옮겨가게 되니까. 여기에 몇 가지 양념만 뿌리면 상황종료다. 상품의 정확성, 상인의 신뢰성, 브랜드 가치성. 다만 방심하지 말아야 할 지점은 역시 고객이다. 한두 번 팔고 고객을 주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폭망’이 진행된다고 경고했다. “그 어떤 성과에도 취하지 말 것. 그래 봤자 아직 사람일 뿐”이란 좌우명까지 꺼내들며 말리고 나섰다.
책의 미덕은 ‘기본’에 있다. 사실 온라인시장을 장악하는 e커머스전략은 나올 만큼 나온 상태다. 시장이 없으면 만들라고 하고, 뭐든 색다른 콘텐츠를 들이대고, 소비자의 은밀한 취향까지 들춰내라는 내용은 누구라도 ‘설’을 풀 수 있을 정도다. 그렇게 하나라도 더 꿰고 뚫고 나가야 할 이 전쟁통에 저자는, 올곧게 상도를 걷자 한다. 진솔하게 고객을 찾고, 한 사람에게 집중해 하나씩만 팔자고, 먼 산을 보지 말고 눈앞의 나무를 보자고. 굳이 일침이라면 ‘이익이 없다면 사업이 아니’란 것, 하루에 100원이라도 ‘남기는’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쯤 될까. 아는 만큼 보이듯, 듣는 이에게만 들린다는 ‘세상의 비법’ ‘장사의 철학’이 그렇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