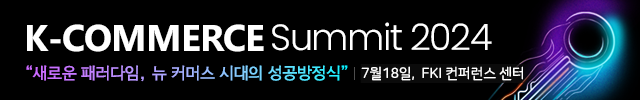|
[이데일리 SPN 정철우 기자] 외국인 선수는 늘 많은 뉴스를 몰고 다닌다. 야구를 잘하면 잘하는대로, 못하면 못하는대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다.
야구 외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우리와 다른 문화에서 살아 온 탓에 우리와는 다른 이야기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헛웃음을 남겨준 선수들은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동안 즐겁게 혹은 어이없게 웃음을 준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
마이크 부시(전 한화)는 외국인선수에 대한 환상과 절망을 안겨준 대표적 인물이다. 그가 한국땅을 처음 밟은 건 1998년.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을 통해서였다.
당시만해도 메이저리그는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이라 여겨졌다. 부시는 그런 메이저리그서 뛴 경력을 지닌 선수였다.
특히나 LA 다저스 시절 '코리안 특급' 박찬호와 함께 뛰어 우리에게도 익숙한 선수였다. TV로나 보던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에서 뛴다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됐다.
부시는 시즌 초반 홈런을 몰아치며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내 실력이 드러났다. 변화구에 취약했던 것이다. 고질적인 무릎 부상은 그의 약점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다. 결국 2할1푼3리라는 초라한 타율과 함께 퇴장했다.
데이비스(전 한화)는 야구적으로도 나무랄데 없는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야구장 밖에서도 그의 일상은 화제가 됐다.
특히 한국의 대표 라면인 S라면 매니아로 알려지며 더욱 친근감을 안겨줬다. 퇴출된 뒤에도 한국에서 그 라면을 구입해 먹었을 정도다.
호세는 롯데 팬들의 애증의 대상이다. 빼어난 실력으로 1990년대 롯데의 마지막 영광과 함께한 빅 스타였다. 또한 거침없는 성격 탓에 시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1999년 플레이오프서는 관중이 던진 물병에 맞은 뒤 배트를 집어던져 출장 정지를 받기도 했다.
계약 때도 늘 말썽이었다. 이중계약 파문을 일으켜 롯데 팬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롯데 출신 외국인 선수 중 쓴 웃음을 준 장본인도 있다. 메이저리그 홈런왕 출신인 호세 칸세코의 쌍둥이 형인 아지 칸세코였다.
그는 동생만 못한 형이었다. 그 역시 한때 메이저리그의 대표적 유망주였지만 한국에 올 땐 이미 전성기를 지난 다음이었다. 거친 스윙은 공을 맞히는데도 힘겨워 보였다.
다만 쇼맨십은 야구 기량을 훌쩍 뛰어넘었다. 시범 경기 내내 헛방망이를 휘두르던 아지 칸세코는 첫 안타를 때려낸 뒤 1루에서 홈런 세리머니를 펼쳐 웃음을 자아냈다. 그를 보고 웃었던 건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타이론 우즈(전 두산)는 코리안 드림의 대표주자였다. 우즈의 가공할만한 파괴력은 두산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일본에 진출한 뒤에도 성공시대를 활짝 열었다. 변화구 대처 능력도 빼어나 일본 무대서도 가공할 파워를 뽐낼 수 있었다.
성공은 그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줬다. 50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며 최고 선수 대우를 받았다. 차명석 LG 코치는 "몇년 전 오키나와 전지훈련 때 해변에서 우즈를 만났는데 시계와 목걸이 등 치장만으로도 몸에 1억원 어치는 하고 있는 듯 보였다"고 말했다.
피커링(전 SK)은 당혹감을 안겨준 외국인 선수였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강타자 데이빗 오티스를 떠올리게 할 만큼 큰 덩치의 강타자였다. 그러나 향수병에 시달리는 연약한 모습 탓에 조기 퇴출의 아픔을 맛봐야 했다.
지방 원정이라도 가면 그의 향수병은 더욱 커졌다. 늦은 밤 그의 방에선 커다란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에레라(전 SK-롯데)와 기론(전 롯데)은 철저한 생계형 외국인 선수였다. 대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었던 둘은 야구 장비를 아껴써야 했을 정도다.
특히 에레라는 쓸 수 없는 방망이를 실전에 들고나가는 기행(?)까지 선보였다. 손잡이 부분에 금이 간 방망이를 테이프로 둘둘 말아 쓰는 것이 목격돼 선수들을 경악케 했었다.
한국 야구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왔던 선수들도 있다. 해리거(전 LG)와 프랑코(전 삼성)가 주인공이다.
해리거는 2000년 LG의 에이스였다. 무려 17승을 거두며 다승 2위에 오른 그는 팀을 플레이오프로 이끈 1등 공신이었다.
당시 해리거는 우리 나라에선 생소했던 컷 패스트볼을 선보였던 첫번째 선수였다. 각이 크게 떨어지는 슬라이더에 익숙했던 타자들은 스트라이크 존 바깥쪽을 살짝 걸치며 막판에 휘는 컷 패스트볼에 맥을 추지 못했다.
프랑코는 웨이트 트레이닝 열풍을 불러왔다. 한국에 입단할 당시 이미 마흔살을 훌쩍 넘겼던 그다. 그러나 철저한 자기 관리와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20대 못지 않은 힘을 발휘했다.
당시 그와 함께 뛰었던 김상진 현 SK 코치는 "처음에 와서 자기가 "나는 야구 전도사"라 말할때만 해도 곱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는 모습에 많은 선수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프랑코의 이야기가 각 팀에 퍼지며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 관련기사 ◀
☞2010시즌 외국인선수 면면을 살펴보니…
☞[베이스볼 테마록]외국인 선수, 트랜드가 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