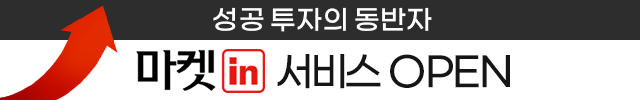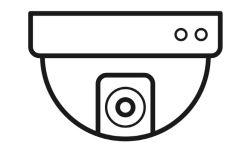|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다음 경기에 또 등판한 정찬헌이 흔들림 없이 자기 공을 던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마음을 놓았다고 했다. “경험 많은 선수나 외국인 선수라면 달랐겠지만 어린 선수가 부담을 느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기 후 항의를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야기는 ‘좋은 사람 김시진’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일화 중 하나다.
하지만 반대의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중 모션은 분명 금지돼 있는 불법 행위다. 경기 중 문제가 드러났다면 감독이 어필해서 바로 잡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만 자신이 이끄는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넥센의 한 선수는 “감독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한다. 하지만 가끔은 그럴 때 좀 더 강하게 어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갖게 된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야구 격언 중 “사람 좋으면 꼴찌”라는 말이 있다. 나쁜 짓을 해서 이기라는 뜻이 아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최대한 독하게 굴 필요가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물론 그 독함은 규칙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승리에 대한 열정과 의욕은 자칫 상대편이나 제 3자에겐 지나친 욕심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더욱 그렇게 보인다. 1등은 승리에 대한 끝없은 열망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등 팀 감독은 더 외롭다. 상대는 물론 자신의 선수들에게도 더욱 모질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1등팀, 특히 장기 집권하는 팀을 대상으로는 언제나 ‘공공의 적’이라는 표현이 따라 붙는다. 그리고 그 모든 화살을 앞에서 맞고 버텨내야 하는 자리가 바로 감독이다.
하지만 큰 형님 처럼 사람 좋은 리더십 만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그에게서 변화의 바람이 느껴지고 있다. 김 감독은 롯데의 스프링캠프 출발에 앞서 선수들에게 “올해는 ‘못됐다’는 소리를 듣자”고 주문했다. “우리는 승부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선수들이 나쁘게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 승부욕을 더 보여줬으면 싶다. ‘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독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물론 가장 먼저 앞장설 인물은 바로 김 감독 자신일 것이다.
김 감독은 지도자로서 빠르게 문제점을 인정하고 변화를 주는 것이 장점으로 꼽혀왔다. 감독 초기, 번트에 대해 부정적 언급을 자주 했었지만 노하우가 쌓이며 “감독 입장에서 번트는 또 하나의 효율적이자 적극적인 공격방법”이라는 지론으로 재무장하기도 했다.
김 감독의 전략적인 ‘나쁜 남자’ 변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자못 흥미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