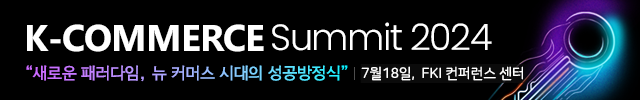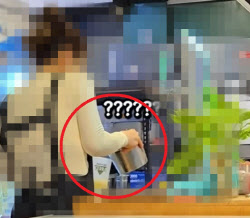|
깃발 든 ‘원조 친노’… 목소리 내는 군소후보
`빅3`가 공식 출마 선언을 미루는 사이 `원조 친노`인 이광재 의원이 27일 출사표를 던졌다. 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에 이은 세 번째 공식 선언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출마 선언식에서 “정치혁명으로 경제와 외교가 강한 나라를 만들어 G3에 도전해야 한다”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미국 및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대교체, 세대교체, 선수교체 `삼박자`가 필요하다”며 “일류 국민은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뛰어넘어 일류 사회를 원한다.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신념의 정치를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많은 나라`, `공정한 사회`, `국민 통합`을 위한 책임 총리제와 선거구제 개혁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친노` 핵심 인사다. `세계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를 출마 슬로건으로 내건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잇고 `문재인 뉴딜`을 성공시키겠다”며 `친노` 적통임을 강조했다.
정치권에 부는 세대 교체 바람을 의식한 듯 “청년세대에 `광재형`이라 불리고 싶다”는 바람도 남겼다. 86세대인 이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연세가 많았음에도 IT시대를 열지 않았나”라며 “나이가 젊고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를 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대권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도 이날 세 번째 대선 공약 `온국민 커리어 형성권`을 제안하며 `빅3`를 정조준했다. 전 국민에 경력계발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복지 정책인데, “1000만원(이재명), 3000만원(이낙연), 1억원(정세균)을 주겠다는 현금 살포식 소득복지정책은 안 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충청 대망론을 노리는 양승조 지사는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발표한 재산세 기준 완화에 날을 세웠다.
양 지사는 “종부세, 재산세 기준 완화에 반대한다”면서 “`썩은 생선`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잡아야지, 썩은 내를 맡고 달려드는 파리(부동산 세제)만 잡아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복잡해지는 경선 구도… 후보 간 연대 가능성도
아직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빅3`를 포함해 민주당 대선주자는 6명으로 늘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대선 경선이 다가올수록 후보 간 연대를 위한 물밑 협상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이 의원의 출마 선언식에는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조정식·정성호 의원 등 `이재명계` 핵심도 총출동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양 지사의 출마식이 열린 세종시까지 직접 내려가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빅3`가 군소 후보 출마까지 직접 챙기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다수의 주자들이 경쟁해야 민주당 경선도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면서 “단 1%의 차이로 최종 후보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군소 후보를 향한 구애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