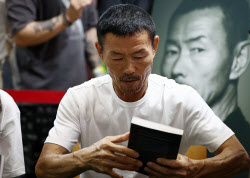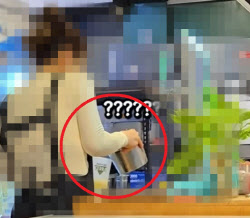|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연초부터 예기치 못했던 미국발(發) 돌발악재가 몰려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과 GM의 한국 시장 철수설은 당초 예상이 어려웠던 먹구름이다. 여기에 미국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 속도도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경제 심리다. ‘삼각 파고’의 실제 경제적 후폭풍은 아직 가늠이 어렵지만, 가계와 기업을 중심으로 심리가 꺾이는 흐름은 확인되고 있다. 중국의 사드 충격이 잠잠해지니, 이번에는 미국이 압박하는 꼴이다. 일각에서는 불과 1년 만에 3%대 성장 경로를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점차 어두워지는 경제 심리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달 제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5로 전월 대비 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월(75) 이후 1년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BSI는 기업가의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해 작성된다. 기준치인 100을 넘어설 경우 긍정적인 응답을 한 업체가 더 많다는 의미이며, 100 이하이면 그 반대다. 한은은 이번달 BSI를 위해 지난 9~20일 전국 33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제조업 심리가 악화한 것은 철강 등 1차금속(-17포인트) 영향이 컸다. 조선업과 자동차업이 여전히 부진의 늪에 빠져있는 게 주요 요인이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産) 철강을 제재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철강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고 싶다” “만약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면 부과하도록 하자” 등의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추가 제재를 피할 가능성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일부 업종의 반덤핑관세로 인해) 여태까지는 참을만 했던 일부 업종들이 이제는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수출기업의 부진은 특히 우려된다. 이번달 수출기업 업황 BSI는 86으로 전월 대비 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8월(84) 이후 최저다.
가계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108.2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107.4) 이후 5개월 만의 최저치다. 이 역시 미국의 통상 압박 탓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심리 지표는 그 신속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거시 지표들은 길게는 두 달 정도 지나야 나온다. 통계청이 내놓는 산업활동동향 혹은 한은이 발표하는 국내총생산(GDP) 등이다. 경기를 ‘리얼타임’으로 가늠할 수 있는 만큼 정책당국도 이를 주의깊게 살펴본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GM의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것도 경제는 곧 심리이기 때문”이라며 “실제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고 GM의 철수도 현실화한다면, 생산 소비 고용 등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3% 성장’ 경로 이탈할 수도
미국 국채금리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도 주요 리스크로 꼽힌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장기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20bp(1bp=0.01%포인트) 상승한 2.8962%까지 올랐다. ‘심리적 저항선’ 3%에 어느덧 가까워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이날 국내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과 비교해 1.17%(28.78포인트) 하락한 2427.36으로 거래를 마쳤다. 정책당국 한 관계자는 “주가가 떨어졌다는 보도가 많이 나올 때 각종 경제 심리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금리 급등이 가계대출로 옮겨붙을 경우 실물경제도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상황이 이렇자 3%대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3.1%)이 3년 만에 3%대로 상승했다가, 1년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올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