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최측근 “입당설은 억측…언론이 과장”
초등학교·대학교 동기이자 윤 전 검찰총장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 전 총장의 입당설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한테 ‘입당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어떤 결정도 한적이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고 답했다.
그간 윤 전 총장을 둘러싸고 ‘평당원 자격으로 입당할 것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들어올 것이다’ 등의 각종 추측성 보도들이 쏟아진 상황에서, 그의 최측근이 입당설 자체를 일축하는 발언을 한 셈이다. 이 교수는 ‘언론의 해석이 붙으면서 과장됐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대표 주자라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합류해야 대선 레이스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가 입당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건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만큼, 입당시 자칫 본인의 대선 후보 지지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인 한 야권 인사는 “입당을 좀 지켜보자는 기류가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대선 후보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망설이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입당 기정사실…尹이 직접 말해야” 지적도
한때는 그가 기존 정당이 아닌 `제3지대`를 택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왔다. 다만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쇄 접촉하면서 입당설이 기정사실화되기도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정진석, 윤희숙 의원과 잇따라 회동을 진행했다. 장제원·유상범 의원과도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당 결심을 세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 선배이자 동갑내기 친구인 권 의원은 “굳이 우리 당 의원들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결국 대권 도전은 우리 당과 함께하겠다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입당 시기는 전당대회 이후로 예상했다.
당 대표 후보자들 또한 일제히 윤 전 총장을 데리고 오겠다고 앞다퉈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고향이 충남 공주인 것을 들어, 충청대망론을 현실화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우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입당 여부를 두고 입장 차이가 확연한 상태에서, 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의 입당은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남의 입을 빌려 말하는 `간접정치`에서 벗어나 `직접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꼬집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전 총장은 본인의 입으로 얘기해야 한다. 간 보는 것도 아니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검찰의 병폐적인 병폐다. 본인의 국가 안보관, 복지관, 노동관이 뭔지 아무 것도 모르겠다”면서 “국민의힘 입당을 제외한다면 제3지대 정치를 선언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이미 시간도 없고 한계도 명확하다. 국민의힘 당 대표가 선출된 이후 입당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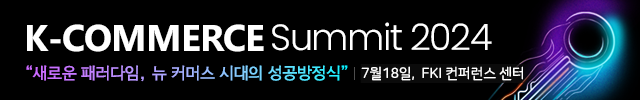




![中 육상 여신, '외모 치장' 일축…100m 허들 최고 기록 경신[중국나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100828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