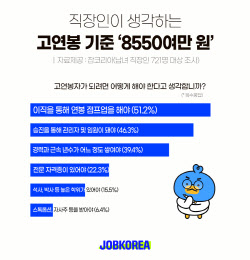|
|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한 무역장벽 건수를 제조업 7개 산업을 대상으로 패널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역장벽 건수가 전년비 1% 증가할 때 수출기업 수가 연간 최대 0.22% 감소했다. 반면 수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무역장벽은 기술표준, 안전, 위생, 환경, 안보강화 등의 비관세 조치를 말한다.
신상호 부연구위원은 “무역기술장벽 증가는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이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의 퇴장을 촉진하고 신규진입을 억제해 수출 기업 수를 감소시켰다”면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비용흡수 능력이 높은 대기업에 집중돼 있어 수출금액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중국 수출을 위해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e)라는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그로 인해 수출 업체의 비용 부담이 생기게 된다. 다만 2015~2019년까지 5년간 무역기술장벽으로 관련 비용이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보고서는 산업별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등 관련 부문이 높을수록 무역기술장벽에 영향을 덜 받는다고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기계 제조업, 비금속광물·금속제품 제조업 등은 무역기술 장벽의 영향력을 덜 받았다
우리나라가 무역장벽 관련 현안을 제기한 건수는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4건, 2018년 3건, 2019년 7건이다. 그 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11건, 2021년 16건으로 급증했고 2022년 6건, 2023년 5건으로 낮아진 바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로는 분석을 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무역장벽 건수가 급증한 데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무역장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더 커졌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글로벌 무역경보(Global Trade Alert)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무역 제재 건수는 2019년 1100개였으나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3200개, 3000개가 신규로 생겨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작년 1월 무역 제재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7%가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작년 10월엔 무역장벽이 심화돼 중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간 상호 교역이 축소될 경우를 가정, 우리나라 GDP 감소율이 최대 10%로 피해가 중국(6.9% 감소)보다 클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에선 대중 수출 비중이 최대였을 때를 기준으로 해 과대 추정됐다고 밝혔지만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개방경제이면서 무역분쟁이 지속되는 미국과 중국을 최대 수출국으로 둔 제조업 국가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의 무역장벽은 단순 비용 부담이 아니라 자국 생산, 특정 국가의 원재료 조달 제한 등으로 대기업에도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