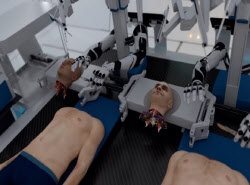|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중국 견제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기대를 모았던 북한의 도발을 막고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한·미·일 3각 공조, 北 문제서 공급망·기후변화 등으로 다변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2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소재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소(APCSS)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3국이 특별한 계기 없이 별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 만난 것은 2020년 1월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 회동 이후 2년여 만이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이후 공동성명이 나온 것은 2017년 2월 이후 약 6년여 만이기도 하다.
한·미·일 협력과 공조의 범위도 대폭 넓어졌다. 그간 한·미·일 3국 협력과 공조는 대북정책에 중점을 뒀지만, 이번에는 “기후위기, 핵심 공급망, 성평등 및 역량 증진, 개발 금융,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차기 팬데믹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포함한 국제 보건 안보 등에 대한 공동의 접근법”을 우선순위로 뒀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일 프로세스는 90년대 중후반 페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탄생한 티코그(TCOG,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그룹)에 기반을 둔 만큼, 과거 공동성명은 주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번 공동성명은 물론 북한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글로벌 경제 안보, 기후변화, 공급망 등 다양한 협력 분야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미·일 3국 협력과 공조 확대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 속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실제 이날 공동성명이라는 단어에서 중국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성명서 곳곳에는 유엔해양법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등 중국을 겨냥한 문구가 곳곳에 등장했다.
특히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한·일 장관들이 환영했다”는 부분이 성명에 담긴 것이 인상적이다. 김현욱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오커스, 쿼드, 미·일·호주 협력 등 동맹을 통한 인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미·일은 이 고리에서 빠져 있었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소원했던 3국을 묶을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성사됐다. 지난해 11월 하야시 외무상이 취임 이후 첫 회의다. 다만 양 장관 회담에서는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기존 과거사 문제를 놓고 날 선 대립이 반복됐다.
韓, 美에 대북 관여 아이디어 제시했지만
관심을 모았던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고 ‘조건없는 대화’를 한다는 원칙적 대북 기조를 재확인하는 정도의 메시지로 수렴됐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분명한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북한에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해 제재·압박 수단 역시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핵수석대표 협의와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다양한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회견에서 공개할 정도로 논의가 숙성되지는 못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모라토리엄 파기 등을 예고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고 있음에도 이번에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는 점은, 북한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후순위로 밀렸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228명 태운 비행기, 하늘에서 사라졌다…승객 ‘전원 사망'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200002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