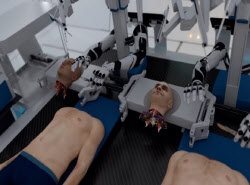|
[이데일리 오현주 기자] “쳐다보기도 힘들 만큼 거대한 노송 앞에 서면 나는 한없이 작아져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설상가상, 갈아놓은 먹물이 꽁꽁 얼어붙으면 노송 주위에 떨어진 솔잎을 태워 언 붓을 녹여가며 그려야 한다. 어둑어둑 땅거미가 질 때까지 매달렸어도 회심작은 나오지 않고, 곰솔처럼 까맣게 애태우기를 몇 번이던가.”
한국화가 문봉선(51·홍익대 교수). 그가 전국 산천을 돌며 언 손으로 먹을 갈아 사생한 소나무들이 대작으로 다시 태어났다. 강릉, 경주, 울진, 양산 통도사 등을 돌며 소나무를 스케치하고 작업실에 돌아와 화선지에 옮기는 일을 3년여간 해온 터다. 그리고 그 소나무 그림만으로 전시를 연다. ‘독야청청, 천세를 보다’다.
일필휘지. 그의 소나무는 망설임이 없다. 큰 붓으로 한 호흡을 품고 마치 난을 치듯 쳐올라간다. 그렇게 그려진 소나무는 웅장한 기백으로 주위를 잠재운다. 초서의 필력을 동원한 전통필법으로 7∼10m에 달하는 화폭에 꼿꼿이 세운 거대한 소나무들이다. 덕분에 전시장은 소나무숲이다. 그 둘레에 바람이 머물고 구름이 멈추며 달이 걸리고 눈이 덮인다.
작가가 소나무에 관심을 가진 지 30여년. 제주 해송을 그린 것이 시작이다. 1987년 26살에 이미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을 비롯해 ‘동아미술제’ ‘중앙미술대전’ 등 국내 대형 공모전을 두루 휩쓸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30여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문봉선 필법의 소나무 만들기’가 쉽지 않았던 까닭이다. 난과 매화 등을 그리면서 우리 자연을 섭렵하다 3∼4년 전에서야 비로소 소나무에 몰입했다.
가능한 한 배경을 빼버리고 온전히 소나무에만 집중했다. 그림엔 회색이 없어 오로지 흑과 백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농묵으로 구사한 원근이 느껴진다. 기교없이 한 획으로 힘차게 그어내린 소나무들엔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섞여 있다.
|
‘경주 삼릉 송림’이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가장 긴 그림이다. 가로 1000㎝, 세로 245㎝ 화폭에는 붓대로 쓸다시피 그려진 소나무가 세워졌다. 대작 20여점 가운데는 ‘천세송(千歲松)’도 있다. 조선후기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별장으로 사용했던 석파정에 자리잡은 수령 600년의 노송이다. 온통 검은 소나무들 사이에 하얀 ‘설송(雪松)’ 두 그루도 보인다. 쌀가루 빻은 것을 아교에 이겨서 화선지에 발라 그렸다. 선인의 지혜를 빌린 이 기법 덕에 설송은 세월이 갈수록 하얘진다고 했다.
작가가 설명한 소나무의 ‘지방색’도 재미있다. “전라도에는 앉은뱅이 소나무가 많다. 경상도 소나무는 키가 크다. 경북 울진엔 30m짜리가 자란다. 금강송이다. 그림 그리기에 운치있는 건 전라와 강화의 소나무다. 강릉의 소나무는 죽 뻗은 직선이라 재미가 없고, 경주 소나무는 너무 길어 엄두가 안 난다.”
그러나 소나무는 소나무다. 그 기상이 어디로 가겠는가. 진정한 목신(木神)은 소나무가 아닐까 싶다는 작가가 일러줬다. “소나무는 한 그루만 그려도 그림이 된다. 말 그대로 독야청청이다.” 서울 부암동 서울미술관에서 12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02-395-0100.



![228명 태운 비행기, 하늘에서 사라졌다…승객 ‘전원 사망'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0200002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