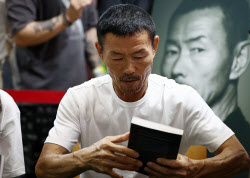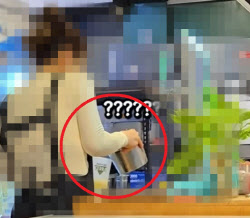|
공정위와 야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은 총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나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3조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상이다. 플랫폼 산업계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점이 핵심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최혜 대우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 상대가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는 일을 막는 행위) 등 금지 의무를 적용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은 사후 규제만 존재하기 때문에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온플법으로 지위 남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미리 정하고 규제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민호 교수는 공정위가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온플법 추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의 경우 자국 빅테크 기업이 없어 미국의 구글 등을 제재하기 위해 디지털 시장법이나 디지털 서비스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온플법과 유사한 유럽의 DMA법은 규제 대상이 미국 빅테크를 겨냥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연 매출 75억유로(10조원) △시가총액 750억유로(106조원) △월간 플랫폼 이용자(MAU) 4500만명 △3개국 이상 진출 등을 충족하는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한다. 결국 자국 빅테크 기업이 없는 EU가 미국 기업에 의해 생태계가 좌우되는 것을 경계하고, 역내 기업들이 기초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투 트랙’ 전략인 셈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 기업들이 온플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정보통신기술(ICT)을 포함한 업계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민호 교수는 “공정위는 경쟁환경 조성으로 이용자와 사업자의 후생을 높이기 위해 온플법을 추진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토종 기업들이 후퇴하는 결과가 예상된다”며 “국내 토종 플랫폼들이 쇠퇴하게 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종속성이 커질 수 밖에 없고, 국내 이용자들이나 중소 사업자, 중소상공인들 모두 불리한 환경에 놓일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예를 들어 수수료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나마 국내에 토종 플랫폼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플랫폼 수수료를 현행 수준으로 받는 경향도 있다”며 “구독료를 계속 올리는 넷플릭스나 수수료율을 올리는 구글, 애플 등 앱스토어는 경쟁사가 없다. 온플법이 도입되면 눈에 보이듯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께서 최초에 약속하신 것처럼 자율규제에 대한 성과가 더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며 “기존에도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방편은 충분하다. 시장 환경 또한 계속 융합 서비스가 나오기 때문에 독점이 불가능한 완전 경쟁 환경”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