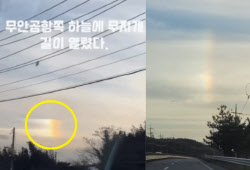우리나라 문화재 사진의 개척자이자 1인자로 평가받는 고(故) 한석홍(1940~2015) 작가의 아들 한정엽 한국문화재사진연구소 실장의 설명이다. 한 작가는 1970년대부터 국립박물관을 시작으로 40여 년간 우리 문화유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왔다. 2000년대 이전 국립박물관 유물과 국보 사진 대부분을 그가 촬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재계에서 그를 ‘국보급 사진작가’라 부르는 이유다.
|
한 실장은 아버지를 이어 2대째 문화재 사진작가의 길을 걷고 있다. 그를 만난 것은 최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문화재사진연구소 사무실에서다. 연구소 지하실 서재에는 한석홍 작가가 한평생 촬영한 사진도록과 필름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분량이었다. 한 실장은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지만 최소 수만장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이 떠올린 한 작가의 사진에 대한 애착은 대단했다. 그는 “아버지께서는 필름을 분신처럼 생각했다”고 표현했다. 하나의 일화로 연구소 사무실 공사할 때를 이야기했다. 당시 지하실 콘크리트 일부가 무너졌는데 필름이 날아갈까 걱정됐던 한 작가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고 그는 회상했다.
문화재 사진을 대하는 자세도 남달랐다. 일반적으로 사진을 감상·취미용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한 작가는 사료로서 가치를 강조했다. 한 실장은 “아버지께서 생전 사진 촬영 시 유물 보존·연구를 염두에 두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다”고 떠올렸다. 그렇기에 한석홍 작가가 작업을 할 땐 최순우·정양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당대 최고 문화재 전문가들이 옆에 있었다.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고증을 받기 위해서다.
한 실장은 “탁본도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르듯 사진도 누가 함께 고증을 하는지에 따라 어떤 역사적 의미, 포인트를 담을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당시 찍은 유리건판 사진을 예로 들며 “이 사진들을 보면 유물, 사람들의 배치 등에서 식민지적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번호표를 붙여 인체측정을 하는 사진까지 나오는데 그는 “굉장히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문화재는 시간이 갈수록 모습이 계속 변화·부식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진을 찍어두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한 실장은 “문화재를 시기·분류별로 씨줄날줄 잘 엮어서 보존해야 후대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면서 “조선후기부터 현재까지 워낙 양이 방대하다보니 체계적 정리가 부족하다”고 안타까워했다. 한국 최초의 사진관 ‘천연당 사진관’을 열었던 해강 김규진이나 개화기 사진작가 황철 선생 등 1800~1900년대 사진 상당수의 소재를 알기 어려운 점이 이를 방증한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사진 관리를 위해 나섰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