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태형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평창대관령음악제가 한창이던 7월 29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뮤직텐트에서 프로코피예프의 오페라 ‘3개의 오렌지에 대한 사랑’을 봤다. 한국 초연으로 연주회용 콘체르탄테(오페라콘서트)였다. 본고장 가수들이 노래하고, 조르벡 구가예브가 지휘하는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연주의 러시아 오페라는 매력적이었다. 웃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몰입하느라 허리 아픈 줄 몰랐다. 특히 총주(전체 합주)에서 채찍같이 날카롭게 곤두서던 특유의 사운드는 인상적이었다.
사흘 뒤 8월 2일엔 통영으로 향했다. 다시 마린스키 오케스트라와의 조우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음악감독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이끄는 무대였다. 윤이상 탄생 100주년을 맞아 1200여 객석의 통영국제음악당은 음악 팬들로 꽉 찼다. 단원들이 무대에 입장하자, 게르기예프가 옅은 미소를 띠고 등장했다. 연주에 앞서 보면대를 앞으로 조금 밀고 공간을 확보하고는 밝은 표정을 지었다. 오른손엔 절반 정도 길이의 지휘봉을, 왼손은 손가락을 털듯 힘을 뺀 지휘폼은 여전했다.
첫곡은 프로코피예프의 ‘고전교향곡’이었다. 우아한 가면을 쓴 익살스런 표정이 강조됐다. 게르기예프의 단순한 몸짓 하나로 현악의 온도가 변했다. 2악장에선 오디오 볼륨을 줄이듯 제어하는 지휘자에 피아니시모로 여리게 반응하는 단원들의 연주가 인상적이었다. 3악장에선 음의 덩어리를 방사하는 탄력이 돋보였고 4악장은 민첩한 질주로 매끈하게 곡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협주곡. 예정과 달리 프로그램과 협연자 모두 바뀌었다. 애초 발레리의 아들이자 피아니스트 아비살 게르기예프가 프로코피예프 협주곡 1번을 연주할 예정이었으나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로자코비치가 브루흐 협주곡 1번을 협연했다. 연주 당일 변경 소식을 듣고는 속으로 ‘이게 웬 떡이냐’ 했다.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DG)와 계약한 2001년생 바이올린 신동을 직접 보게 됐으니 많은 음악 애호가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으리라.
‘명불허전’이었다. 연주에 앞서 시간을 들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악기 조율을 했다. 1악장은 섬세한 비브라토가 귀를 잡았다. 서두르지 않고 발을 들어가며 자신감 있게 표현했다. 바이올린뿐 아니라 떨리고 휘어지는 몸 전체가 악기 같았다. 신중하게 돌다리를 두드리며 소중한 것을 다루듯 나아갔다. 2악장은 백미였다. 버들가지가 휘듯 낭창대는 현악기 소리는 실로 오랜만에 접해보는 진경이었다. 3악장에서도 로자코비치는 한 음 한 음 충실하게 연주했다. 가끔씩 성마른 소리가 나거나, 막판에 좀더 밀어붙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 젊은 바이올리니스트에게선 도무지 자신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찾을 수 없었다. 오로지 음악이 우선이었다. 앙코르 바흐의 알르망드를 연주할 때는 눈을 감고 발끝을 들어올렸다. 깨지기 쉬운 물건을 안고 춤을 추는 듯했다. 베르비에 페스티벌에서도 호평 받더니, 앞날이 기대되는 바이올리니스트다.
2부의 메인은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클라리넷이 주제 선율을 연주하고 작은 소용돌이가 일었다. 특유의 채찍같은 날카로움이 현악군에서 감지됐다. 금관이 포효하고 더블베이스의 피치카토가 선명했다. 셈여림의 조절도 발군이었다. 총주에 이르러 더욱 매셔워졌다. 게르기예프의 지휘는 소금을 뿌리는 듯한 주관적 왼손과 짧은 지휘봉을 든 객관적인 오른손의 밸런스로 이루어진 듯했다.
2악장은 두터운 현악 속 호른이 주제를 노래했다.템포는 서두르지 않고 느리게 가져갔다. 관현악 총주가 주제선율을 연주하자 매서운 사운드가 터져 나왔다. 밀고 당기듯 주제를 처리하는 유동적인 스토리텔링은 러시아 문학 같이 깊은 빛을 발했다. 끝부분은 고즈넉했다. 소리가 빨려 들어가는 듯했던 정적은 일품이었다.
호두까기 인형을 연상시키는 3악장에서 게르기예프는 완급 조절을 통해 아름다움을 이어갔다. 4악장은 주제가 승리를 연상시키며 낙하지점까지 오르는 롤러코스터를 연상시켰다. 곧 이어 팀파니의 격렬한 연타와 날카로운 연주가 결합돼 분출됐다. 음악은 점차 생기를 띠고 운명의 주제 나올 때 악장은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고 혼신의 힘을 다했다. 가장 러시아적인 부분이 펼쳐지고 있었다. 금관이 작렬하고 현악군은 트레몰로를 강조했다. 그 위로 게르기예프를 살피는 단원들의 성실성이 떠올랐다. 최후의 속도감도 일품이었다. 본고장 러시아의 차이콥스키였다.
마린스키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유럽이나 미국 오케스트라와 사뭇 달랐다. 암흑에서 광명으로 나아가는 베토벤의 모토와 유사한 해석과 달리 러시아만의 슬픔과 우울이 배어 있었다. ‘키로프의 차르’에게 보내는 단원들의 신뢰는 무척이나 두터워 보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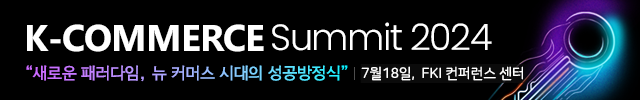





![“지적장애 동생이 실종됐어요”…믿었던 친형의 배신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200001t.jpg)

![中 육상 여신, '외모 치장' 일축…100m 허들 최고 기록 경신[중국나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100828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