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막상 도착한 도시의 곳곳에서 나는 성당을 보았다. 거의 매 구역마다 크고 아름다운 성당이 있어서 안에 들어가 비슷하면서도 묘하게 다른 내부를 구경했고, 불어는 물론 영어조차 더듬거리면서도 꼼꼼하게 그 연혁을 들여다보곤 했다.
특히 노트르담 성당은 짧은 기간 동안 세 번이나 갔었다. 노트르담(Notre-Dame)은 성모 마리아란 뜻이다. 당연하게도 이 이름을 가진 성당이 세계 곳곳에 많이 존재한다. 가장 잘 알려진 곳이 중세 고딕 건축의 걸작이라고 알려진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일 것이다. 몬트리올의 그곳은 특히 성당 내부가 아름다웠다. 1824년에 처음 건축을 시작해서 여러 번의 개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채광과 조명이 21세기적으로, 초현대적으로 보였다. 소리 울림도 좋아서 크고 작은 음악회가 자주 열린다고 했다.
낯선 도시에서 낯선 언어에 둘러싸여 낯선 예배당에 (나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므로) 혼자 앉아 있자니, 자연히 낯선 곳으로 떠도는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예수 가족도 난민이었습니다’라는 말이 기억났다. 올 여름 예멘에서 온 난민들이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해준 말이었다.
마리아와 요셉을 부모로 두고 태어난 예수는, 두 살 이하 사내아이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피해 살던 곳 베들레헴을 떠나 남의 나라 이집트까지 갔다. 다행히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내쫓거나 죽이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그곳에서 3년간 살며 영아살해라는 끔찍한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2010여 년이 지났을 때, 내전을 피해 가족과 함께 시리아를 떠났던 세 살 배기 소년 크루디가 있었다. 2000년 넘는 시차를 두고 난민 가족이라는 점에서 두 소년의 모습은 꼭 닮아 있었다. 그러나 아기 예수와는 달리, 크루디는 모든 곳에서 쫓겨나 결국 터키 해변에서 비극적인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한 아이는 살아 인류를 구원했지만, 한 아이는 죽어 받아줄 곳 없는 삶의 비극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신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에 관한 교리를 논하고 싶지 않다. 다만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한때 혹은 영원히 자기 땅에서 내쫒긴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고 말하고 싶다. 한국전쟁 당시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난 수많은 이북 출신 피난민 가운데 나의 아버지도 있었다. 그는 인간이 고향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평생을 통해 비극적으로 증명했다. 서울에서 태어난 나는 태초부터 이 땅의 주민인양 살고 있지만, 사실은 피난민의 자식으로 내 삶의 뿌리가 ‘난민의 기억’ 위에 있다는 것을 때때로 확인한다.
예수가 태어났다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보잘 것 없어 서럽고 힘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졌음을 축하하는 시기이다. 이 세상의 삶이 언제든 덧없이 끝날 수 있으니 삶의 중심을 눈앞의 것에 두지 말라는 메시지가 전해진 때이기도 하다. 예수와 그의 가족이 한때 난민이었음을,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고향 떠나 고달픈 이들에게 구원이 될 수 있었음을 일깨우는 나날이다. 낯선 이에게 관대한 것이 실은 자신에게 관대할 수 있는 길임을 일 년에 한 번쯤이라도 생각하게 하는 계절이다. 꼭 노트르담 성당에 가지 않았더라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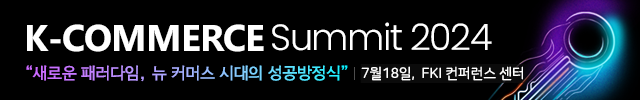





![서유리, 최병길 PD와 이혼 이유 "장모까지 대출…3억 안 갚았다" [전문]](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260007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