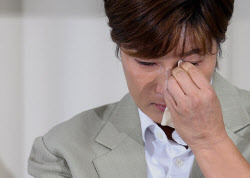|
실제로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2021∼2022년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21.1%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702.7%), 영국(173.7%), 독일(46.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부의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 통제로 한전은 밑지고 전기를 팔아야 했다. 이로 인해 2021∼2023년 누적된 한전 적자는 43조원에 달한다.
가스공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22년 이후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약 200% 상승하는 동안 국내 가스요금은 약 43%만 인상됐다. 그 사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0년 1조2106억원에서 △2021년 2조9298억원 △2022년 12조 207억원 △2023년 15조7659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미수금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분류한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이다.
판매가가 원가보다 낮은 ‘역마진’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회사채 발행, 금융권 차입으로 근근이 버텨왔다. 두 회사가 지난해 이자비용으로 쓴 돈은 6조1300억원(한전 4조4500억원, 가스공사 1조6800억원)이다. 올 1분기에도 1조 5600억원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한전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급격히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해 송전망 투자를 서둘러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의 적자 구조로는 어림없다”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요금 인상폭을 제시했다. 그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올 3분기에 kWh(킬로와트시)당 15~20원, 약 10% 가량 조정이 필요하다”며 “폭발적으로 쌓이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결하려면 20%(MJ당 3.9원) 수준의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보다 역마진 폭이 큰 가스요금 인상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된 공공기관들은 사회적 공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수익성이 낮아도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공공기관의 재무 취약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공공기관들이 무리하게 국책사업을 진행하다 자금 부족으로 공사채를 발행하고, 이자비용이 커지는 자금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기능에 있어 안전·복지 등 공공성이 우선인 핵심 기능은 강화하되, 현업과 관련성이 적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은 민간에 이양·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생겼다”면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공공기관의 슬림화를 추진하고, 민간에 적합한 사업은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비핵심 자산 매각, 정원 감축 등 경상비를 줄이려고 애쓴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공공기관 정상화의 핵심인 요금 인상, 적자 유발 사업 축소 등은 외면해 큰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