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중심부인 광화문광장 일대가 연일 시위대의 고함으로 지새우고 있다. 크고 작은 시위나 집회가 하루에도 4~5건씩은 보통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노동단체에서부터 사드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광화문광장이 주요 집결 장소가 됐다. 지난 정부에서도 비슷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들어서는 아예 집회·시위의 본거지로 자리 잡은 양상이다. 그동안 누적됐던 각계각층의 불만과 욕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 보행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수시로 차량 통행까지 제한 받고 있으면서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길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농성 천막도 마찬가지다. 시위·농성자들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가는 공연히 말다툼만 벌어지기 일쑤다. 경찰도 웬만하면 과격시위에 눈 감고 있으며, 서울시 당국도 농성천막 단속에 시늉만 내는 모습이다. 사회적으로 억눌렸던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세운다는 긍정적인 측면 뒤에 도사린 그늘진 이면이다.
광화문광장 주변만이 아니다. 최근 청와대 앞길이 일반인에게 전격 개방되면서 그 길목인 청운·효자동 주민들은 끊이지 않는 시위 행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조용하던 동네가 시위대의 확성기로 장터처럼 소란스러워진 탓이다. 근처 상점들은 “화장실을 드나드는 시위대 외에 손님들의 발걸음은 끊어져 버렸다”며 하소연할 정도다. 주민들이 오죽하면 “집회·시위의 소음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침해받고 있다”며 청와대와 국회, 경찰청 등에 탄원서를 냈을까 싶다.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기본 권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면 그것도 올바른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서울시 당국이 세종로 차도 폭을 줄여 광화문광장을 만들었을 때의 당초 의도가 ‘시위의 메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닐 것이다. 광화문광장을 걸으며 서울의 분위기를 음미하려는 일반 시민과 외국 관광객들의 권리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시위든 집회든 그 바탕에 건전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이유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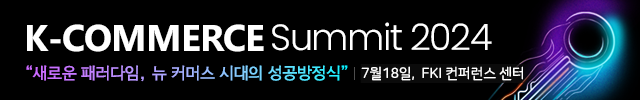

![황당 이혼설 티아라 지연…남편과 사랑템 재주목[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280014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