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일본어는 물고기를 의미하는 ‘魚’를 두 가지 형태로 발음한다. 하나는 ‘우오’(うお)고 하나는 ‘사카나’(さかな)다. 둘의 차이는 간단하다. 생사로 의미가 갈린다. 전자가 살아있는 물고기를 뜻하고, 후자는 죽은 물고기를 지칭한다. 그래서 낚시라는 표현에 붙는 단어는 ‘우오’일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낚아야 하니 ‘우오 츠리’인 것이다. ‘사카나 츠리’는 10년 전 예능 프로그램 ‘패밀리가 떴다’에서 김종국이 죽은 참돔을 잡았다는 의혹에서나 쓸 수 있는 말이었다. ‘말이었다’라고 표현한 데는, 근래 일본에서 ‘우오’가 지위를 잃고 ‘사카나’로 통칭되는 경향 때문이다. 한 가지 섬뜩한 것은 ‘사카나’에 ‘술안주’라는 뜻도 있다는 점이다. 섬나라답게 술안주로 생선요리를 많이 먹어서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문자로는 ‘魚’라고 쓰더라도 살아있는 것과 먹을 것을 구분해 부르던 현명함이 무뎌지고 있는 셈이다. 아쿠아리움의 물고기를 보고 ‘우오’라고 부르지 않고 ‘사카나’라고 부르는 순간, 그나마 ‘자유’만을 박탈당했던 물고기는 ‘생명’마저 빼앗겨 술안주로 전락하게 되고 만다.
4. 한국어를 쓰는 독자라면 이 즈음까지 읽은 마당에 고민을 해야 한다. ‘물고기’는 왜 물‘고기’인가. 물 속에 사는 수중 동물의 총칭이 물고기라는 건, 한국어 화자들이 이들을 그저 식용의 대상으로만 보아왔다는 의미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고기를 ‘식용하는 온갖 동물의 살’로 정의한다. 인간이 동물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어 사전은 ‘사람의 살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도 부연했다. 그 외 ‘어류의 척추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추가되는데 한국어에서 물고기를 제외하고 고기가 ‘단백질을 취할 수 있는 영양원으로서의 다른 동물의 살’ 외의 형태로 쓰이는 경우는 없다. 지구를 구성하는 70%가 바다인 상황에서 그 곳에 거처하는 생명체를 모두 ‘고기’로 표현하는 건 한국어의 궁핍함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다. 보부아르를 빌리자면 “물에서 태어났는데, 고기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살색’을 ‘살구색’으로 바꾸면서, ‘백인’과 특히 ‘흑인’을 담아내지 못했던 한국어의 외연을 넓힐 수 있었다. 한반도에 흑인의 존재가 처음 기록된 건 임진왜란이 마무리되던 1598년 무렵이다. 21세기 지구에서 한국의 반대편 유럽은 식용 동물의 도살 방법을 합법과 불법으로 나누면서 ‘동물권’을 지키고자 하는 시도마저 있다. 개고기를 먹으면서도 ‘견공’으로 일컫던 사유의 탄력성이 필요하다. 물고기에게 다른 이름을 찾아주려는 시도는, 21세기 세계 시민이 되고자 하는 한국어 화자들이 고민을 해봐야 할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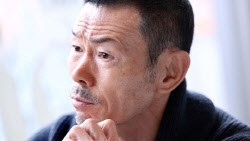


![서유리, 최병길 PD와 이혼 이유 "장모까지 대출…3억 안 갚았다" [전문]](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260007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