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저기는 원래 비상구가 있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혀있긴 하죠.”
지난 28일 찾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목욕탕. 이 목욕탕 관리인은 비상구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시설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 관리하면서 비상구가 없어진 것 같다”고 하면서도 “불이 나도 목욕탕은 물이 많으니 그리 위험하지 않다”며 대수롭지 않아 했다.
◇제천참사 1년만에 목욕탕도, 이용시민도 `무덤덤`
제천 참사가 발생한지도 어느덧 1년. 2019년 새해를 맞아 목욕탕을 찾는 발길이 많아지고 있지만 목욕탕을 비롯한 다중이용업소 운영자와 이용객은 여전히 안전 불감증을 벗어나지 못했다.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우선돼야 하지만 유명무실한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년 전 이맘때인 지난해 12월21일 충청북도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로 29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건물 내 스프링쿨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데다 비상구까지 막혀 있었던 통에 연말을 맞아 목욕탕을 찾은 시민들의 피해가 이례적으로 컸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목욕탕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업소는 벌써부터 참사의 원인을 망각한 듯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 사우나는 지하에서 올라올 수 있는 비상구가 각종 장애물로 막혀 있었다. 해당 사우나 관계자는 “이쪽이 비상구로 가는 길인지 몰랐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건물 자체는 화재 위험이 크지는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비상구 문제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목욕탕 이용객 최모(61)씨는 “목욕탕을 이용하면서 한 번도 비상구가 어디있는지 살펴본 적은 없다”며 “비상구 찾을 동안 입구로 빠져나가는 게 더 빠를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모(55)씨도 “급하면 비상계단이 혼잡해도 어떻게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제천 참사 때도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길목이 창고로 사용되는 바람에 20명이 2층 여탕에서 숨졌다. 이에 소방청이 지난 2월 전국 모든 찜질방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벌여 위반 사항 5704건을 적발했고 이 중 비상구 등 피난시설에서만 2364건(41.4%)에 달했다.
◇신고포상제 유명무실…“활성화가 현실적 대안”
문제는 적발돼도 그때뿐이고 비상구는 다시 막히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이는 소방인력의 부족과 함께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제구실을 못하는 것도 원인이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정부가 지난 2010년 비상구 폐쇄 등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등지에서 출입구와 비상구로 피난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비상구 신고포상제의 신고·포상지급 건수는 크게 줄고 있다. 지난 2011년 포상제 신고건수는 1만6691건, 포상금 지급은 7337건에 달했지만 6년이 지난 2017년에는 신고건수가 410건에 포상금 지급은 210건에 불과했다.
한 소방서 관계자는 “2010년에 신고포상제가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포상금을 노린 일명 `비파라치(비상구에 파파라치를 더한 합성어)`들이 허위 신고를 해오는 통에 소방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며 “그 이후 1인당 포상금 수령액수를 제한하고 지급 조건을 강화하면서 건수가 줄었다”고 전했다.
|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소방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신고포상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지급 조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 스스로 비상구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 대해 불매 운동을 벌이는 등 안전에 대해 민감하게 의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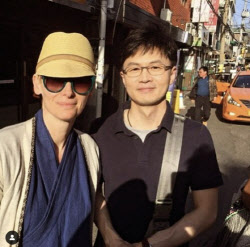
![서울은 아닌것 같아…'자우림' 김윤아 분당살이 까닭은[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3000042t.jpg)
!['1개도 부족한데 이걸?' 팔도, 비빔면 중량 20% '확' 줄인 사연 [먹어보고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3000017t.jpg)
![“고마웠어 잘가”…국내 첫 아쿠아리움 29년 만에 ‘굿바이'[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6/PS2406300046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