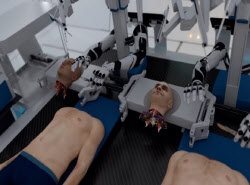|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약 승인이 나지 않는다. “왜 예약이 안되지? 내가 뭘 잘못 입력했나?” 메시지를 보내봐도 집주인은 답이 없다. 결국 예약을 취소했다. 고개가 갸우뚱해졌지만 주인이 바빠 메시지를 보지 못했겠거니 생각하고 말았다.
최근 쿼티나 크리텐든이라는 흑인 여성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서 겪은 사연이 주요 미국 언론에 소개됐다. 노스캐롤라이나주(州)를 여행하기 위해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을 신청하자 주인은 다음과 같은 메세지를 남겼다. “난 니거(nigger·흑인을 비하하는 말)를 싫어해. 그래서 난 당신 신청을 취소할 거야. 여긴 남부 지역이야. 다른 곳을 알아봐.”
화가 난 흑인 여성은 자신 프로필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은 경찰 사진으로 바꿔봤다. 그랬더니 금방 예약에 성공했다. 그는 이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는 200만개이고 누적 이용자는 6000만명에 달한다. 공유경제를 통해 전세계 숙박업계 판도를 바꿨다는 극찬을 받던 에어비앤비가 어느새 인종차별의 온상이 돼버렸다.
돌이켜보면 기자의 예약 신청이 주인 입장에선 썩 내키지 않았던 것 같다. “한국에서 왔는데 에어비앤비는 처음 이용해봅니다. 빠른 예약 확정 부탁합니다.”라고 프로필에 적었다. 동양인인 데다 초짜 냄새 풍기는 게스트였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에어비앤비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에어비앤비는 지난주 공개 콘퍼런스 주제를 아예 ‘다양성과 포용성’으로 정했다.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는 플랫폼의 발전 방향이나 빅데이터 활용 방법 같은 주제를 다루던 자리였다.
에어비앤비 최고경영자(CEO) 브레인 체스키는 “인종차별은 우리에게 정말 중대한 이슈”라며 “에어비앤비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에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별을 없애고 포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회사 운영방식을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로 나눔’을 가장 기본적인 철학으로 하는 에어비앤비가 인종차별 문제에 휩싸였으니 절박할만 했다.
하지만 회의적 시각이 많다. 에어비앤비는 방을 내놓은 주인에게 예약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자신의 집에서 같이 지낼 게스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여자만 있는 집에 남자 게스트를 무턱대고 받기는 부담스럽다. 또한 사고를 일으켰던 이력이 있는 게스트를 받고 싶은 집주인도 없다.
하지만 권한은 어느새 선을 넘어갔다. 사람들은 게스트를 거부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차별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오해하고 말았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둘 사이의 차이는 크다. 거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지만 차별은 억압이다.
에어비앤비 부사장 마이크 커티스는 “인종차별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우리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혼자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푸념했다.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