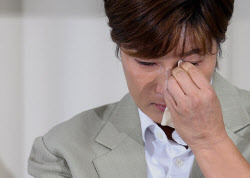그런 대만이 세계가 주목하는 ‘반도체 최강국’에 오른 비결은 뭘까.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TSMC, 인공지능(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 등은 어떻게 AI 시대를 주도하게 됐을까.
①新시장 개척 기업가정신
“TSMC는 고객들과는 경쟁하지 않는다.”
TSMC 창립 멤버였던 쉬친 타이(78) 박사는 최근 BBC와 만나 “(TSMC를 설립한) 1987년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던 ‘파운드리 모델’은 산업 지형을 바꾸고 대만이 리더가 될 길을 닦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시 업계를 주도하던 미국·일본과 맞서기 어려우니, 그 대신 설계는 하지 않고 제조만 하는 사업 모델을 도입한 것이다. 퀄컴 등 공장 지을 돈이 없던 벤처들이 쏟아진 시대 흐름과 맞물려 TSMC는 파운드리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BBC는 “실리콘밸리 팹리스(반도체 설계회사)들은 그들과 경쟁하는데 관심이 없던 TSMC와 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고 했다. 국내 반도체업계 한 인사는 “1980년대만 해도 파운드리는 아예 새로운 개념이었다”며 “기업가정신이 대만계 인사들의 특징”이라고 했다.
엔비디아 역시 비슷하다. 지금은 익숙한 그래픽저장장치(GPU)는 대만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새로 만든 영역이다. 1999년 ‘지포스256’이 시초다. PC의 두뇌인 중앙처리장치(CPU)는 인텔이, 모바일의 두뇌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퀄컴과 미디어텍이 각각 장악한 와중에 새 시장을 연 것이다. 엔비디아가 AI의 과실을 독식하다시피 하는 것은 황 CEO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②정부 주도의 반도체 방패
대만에서 TSMC는 ‘호국신산’(護國神山·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으로 불린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나라를 지켜주는 안보 첨병이라는 의미다.
대만의 ‘반도체 방패’(Silicon Shield)는 정부의 광폭 지원이 기반이 됐다. TSMC는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출신 모리스 창 박사가 1987년 세운 회사다. 이때 대만 정부와 12개 자국 기업이 각각 48%, 25%를 출자해 공기업 형태로 설립했다. 대만 정부의 지원은 그 이후 계속됐다. 특히 최근 라이칭더 신임 총통이 이례적으로 반도체 기업인 궈즈후이를 경제장관에 임명한 것을 두고 업계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TSMC의 소재·장비 납품 협력사인 톱코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다. 재계 한 고위관계자는 “대만은 한국처럼 ‘기업 특혜’ ‘부자 감세’처럼 경제를 정치화하는 목소리가 현저하게 적다”고 했다.
대만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구축할 수 있던 것도 정부 지원 덕이다. 대만은 설계(미디어텍·리얼텍·노바텍·선플러스 등)와 제조(TSMC·UMC·글로벌웨이퍼스 등), 후공정(ASE 테크놀로지스·파워텍 등) 분야에서 골고루 세계적인 기업들이 포진했다. 제조 분야는 단연 최강이다. TSMC와 UMC는 각각 파운드리 세계 1위, 4위다. 미디어텍(모바일 AP 1위), 리얼텍(오디오 칩 1위), 노바텍(디스플레이 칩 2위) 등 팹리스는 세계 2위 규모다. ASE는 세계 최대 후공정(패키징) 기업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디어텍·리얼텍 등은 모두 중소기업에서 시작했다”며 “정부가 신주과학단지를 중심으로 인프라 등을 확실하게 지원한 결과”라고 했다.
|
③반도체 성공에 대한 헌신
대만 굴지의 반도체 기업에서 수년간 일했다는 한 청년이 BBC에 전한 얘기는 또 다른 강점을 암시한다. 이 청년은 “대만 전자기업 엔지니어들은 다른 산업들과 비교하면 보수가 좋다”며 “몇 년간 일하면 대출받아 집을 사고 결혼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매일 아침 7시30분 회의를 시작해 저녁 7시까지 주 6일 근무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경영 구루’ 권오현 서울대 이사장(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이 초격차의 비결로 언급하는 ‘헌신’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권 이사장은 최근 제주포럼 행사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성공을 두고 “리더와 직원들의 헌신 덕분이었다”고 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대만은 실력 있는 학생들이 반도체를 전공하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며 “의대를 선호하는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고 전했다.
④끈끈한 중화권 네트워크
중화권 특유의 네트워크 역시 대만을 지탱하는 힘이다. ‘AI 황제’ 황 CEO도 창업 초기인 1990년대 중반께 직원 월급 줄 돈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그는 결국 TSMC의 모리스 창 전 회장에게 직접 편지를 써 칩 생산을 부탁했다. 이에 당시 64세 모리스 창은 32세 황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젠슨 황이 훗날 “TSMC가 없었다면 오늘의 엔비디아는 없었을 것”이라고 회고한 것은 유명하다. 대만에 뿌리를 둔 두 회사는 그렇게 30년 가까이 밀착했다.
둘뿐만 아니다. 대만계 리사 수 CEO가 이끄는 AMD는 TSMC에 생산을 의존하고 있다. AMD와 합병한 자일링스의 전 CEO 빅터 펭 역시 대만 출신이다. 슈퍼마이크로를 설립한 찰리 량은 대만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으로 넘어가 창업한 것으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