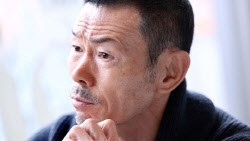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는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부동산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쓰는 일은 절대 안 한다”고도 했다. 투기억제 기조의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경기가 다소 위축되더라도 집값이 투기세력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된다.
새 정부가 내놓은 ‘8·2 대책’은 일단 긍정적이다. 대책 발표 이후 집값 폭등의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의 거래가 줄고 가격도 1억∼2억원 정도 빠진 급매물이 등장했다. 투기과열·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세종시의 분양권 거품도 빠져 1억 5000만원까지 붙었던 웃돈이 5000만원 정도 떨어졌다고 한다. 속단은 이르지만 과열 기미가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다.
선의의 피해를 걱정하는 소리가 없지는 않다. 30~40대 실수요자들이 대출규제 강화로 필요한 목돈이 크게 늘어나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거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소유 2년’에서 ‘거주 2년’으로 바뀌어 1주택자의 갈아타기도 쉽지 않게 됐다는 점 등이 그렇다. 가점제 아파트 청약도 무주택 기간이 짧은 젊은 세대에는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렇더라도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으려면 정책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집값 폭등은 정부가 과거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아 일관성 없이 온탕·냉탕 정책을 펴 온 데 책임이 크다. 시장에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 투기세력의 내성을 키운 것이다. “부동산 불패신화를 끝까지 틀어막을 것”이라는 김 보좌관의 약속이 계속 지켜지길 기대하는 이유다.
하지만 부작용 없이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17번이나 억제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노무현정부의 실패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규제일변도의 정책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장단기 공급대책을 다듬어 시장 심리를 안정시켜줘야 한다. 풍선효과 대비와 함께 실수요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