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지난여름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수출규제’란 카드로 한국의 급소를 찔렀을 때. 국가적 관심과 걱정은 ‘반도체’로 쏠렸다. 아베 총리가 규제대상 품목에 반도체의 핵심소재를 콕 찍었던 이유도 있지만, 반도체가 한국경제에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단 걸 누구나 알고 있어서다. 비록 반도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조자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어도 말이다. 실제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할 정도. 그중 메모리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70%쯤 된단다. 갈수록 쓰임을 다하는 옛 명성만인 것도 아니다. 4차 산업시대에도 강건하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니까. 이쯤 되니 일본이 견제란 걸 할 만한 거다.
그렇다면 한국은 언제부터 반도체 강국이었나. 이 판을 읽어내기 위해선 시간을 좀 되돌려야 한다. 반도체 플래시메모리 제품인 ‘낸드플래시’와 ‘노어플래시’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던 2000년대 초반. 삼성전자가 좀처럼 1위 자리에 오르지 못하던 그때다. 그런데 매듭은 희한한 데서 풀렸다. 홀연히 나타난 ‘스티브 잡스’다. 휴대용 기기를 확신했던 그가 간 하나 보지 않고 낸드플래시를 엄청나게 구입하기 시작한 거다. 바로 애플 ‘아이팟 나노’의 등장이었다. 크기는 줄이고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신의 선택’으로 낸드플래시를 고른 건데. 시장은 이내 평정됐다. 서구권이 밀던 노어플래시 사업은 변두리로 밀렸고, 삼성전자의 낸드플래시가 1인자로 떠올랐다. 당시 아이팟 나노는 출시 3주만에 100만대가 팔렸고, 낸드플래시는 2005년 64%가 성장한 것은 물론 삼성전자는 2005년 매출액을 1.5배나 끌어올렸다.
삼성전자의 낸드플래시가 ‘어쩌다 보니’는 아니다. 플래시메모리는 1980년 도시바가 개발했던 것. 그런데 원체 저품질이라 상품화를 포기하고 1992년 삼성전자에 기술을 내줬던 터. 삼성전자가 제대로 받아 키운 셈이다. 반도체 시장이 거대한 메인프레임에서 개인용 PC와 모바일로 가는 것을 포착해낸 덕이다. 사실 당시 강자는 컴퓨팅 분야에서 플래시메모리의 잠재력을 이미 간파했던 인텔. 그런데 “도시바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낸드플래시의 반전드라마”가 이렇게 펼쳐진 거다.
반도체 개발 검증 업무를 하는 SK하이닉스 연구원인 저자가 ‘반도체’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세심하게 살폈다. A부터 Z까지는 당연하지만, 방점은 기업에 찍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텔·ARM·엔비디아·TSMC·구글 등 반도체 기업이 패권을 다퉜던 변화·혁신의 세월을 아울러서 말이다. 그러곤 그 안에 ‘승자의 법칙’이란 게 끼어 있다면 한 번 제대로 빼내보자고 했다. 비록 반도체가 “규소 위 미세한 소자·금속을 잔뜩 쌓은 물건일 뿐”이지만 아무나 만들고 아무나 차지할 수 없는 누군가의 꿈이었다니까.
|
플래시메모리, 노어플래시, 낸드플래시 등. 벌써 머리가 복잡해졌다면 일단 반도체 마당에서 가장 기본인 두 가지만 짚고 가자.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라는 낸드플래시와 D램.
‘플래시메모리’는 전원이 끊겨도 데이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당연히 데이터 저장이 필요한 전자제품에 필수다. 그 플래시메모리는 칩 내부 전자회로 형태에 따라 ‘낸드플래시’와 ‘노어플래시’로 나뉘는데. 이 중 낸드플래시가 대단한가 보다. 전원이 꺼져도 저장한 정보가 최장 10년을 버틴다고 했다. 그렇다면 D램은 뭔가. 단 하나로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다면 별 걱정이 없겠지만 반도체에 그 둘을 충족시키는 건 없단다. 낸드플래시는 저장능력은 끝내주지만 데이터 처리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빨리 쓰고 지우는 메모리반도체, 그게 ‘D램’이라는 거다.
IT기기에서 낸드플래시는 기억, D램은 속도가 임무다. 관건은 낸드플래시의 ‘최대 용량’, D램의 ‘초고속·초절전’ 기술의 진화라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책상과 책장에 빗댄단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바로 책상과 책장, 그 둘을 꽉 잡고 있는 거다. 올해 2분기 세계 D램 시장의 1위인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45.7%, 뒤이어 SK하이닉스가 28.7%다. 낸드플래시 역시 1위. 올해 1분기 세계시장 점유율이 34.1%다. 2위는 도시바의 18.1%고, SK하이닉스는 5위권인 9.6%.
그런데 이 수치들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위기감은 삼성전자에서 먼저 나왔다. 최근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13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시스템반도체는 정보저장의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중앙처리능력(CPU)처럼 데이터를 해석·계산·처리하는 비메모리반도체. 5G 이동통신, 자율주행차 등으로 메모리·비메모리 간의 벽이 얇아진 상황을 알아챈 거다. 이 부문의 현재 1·2위는 인텔과 퀄컴이란다. 한국은 4%대 점유율뿐이고. 사실 한국이 강하다는 메모리반도체 비중도 세계 400조원 시장 중 30% 정도라니. 자칫 반도체 주류가 바뀐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 아닌가.
고전적인 구도를 깨려는 새로운 도전자도 기웃거리는 중. 중국이다. 2017년 세계 반도체의 30%를 쓸어담 듯 수입한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시작한 거다. 막대한 수입량을 자체 생산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인데, 세계물량의 30%가 어찌 소비될지가 중국의 행보에 달린 셈이다.
△“영원한 1등은 없다”
책에서 반도체 공정이나 기술에 관한 내용이 빠질 순 없다. 전문용어도 적잖다. 복잡한 그래픽과 표는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문외한인 독자에게 어떻게든 마음을 쓴 ‘전문가의 배려’는 책의 미덕이다. 최대한 친절히 풀고 최대한 자세히 해설했다. 그래도 혹여 어려운 용어에 막힌다면 건너뛰며 읽을 순 있다. 하지만 아니다. 이참에 반도체 공부 한 번 해두는 게 어떨까 싶은 거다. 인공지능 5G시대가 그냥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실감할 수 있으니까.
저자의 바람 역시 다르지 않을 터. 적어도 책이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살까’에 대한 그림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그래도 정히 투자를 해야겠거든 좀 넓게 보란다. 가령 어느 반도체 기업의 매출·순이익만 따질 게 아니라 이후 나올 제품이 다른 기업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지 두루 살피란 거다. 예전 잡스의 싹쓸이 구매가 삼성전자를 끌어올렸던 것처럼 말이다. 투자뿐이겠나. 눈앞의 꼼지락거림만 들여다봐선 답이 없다. 결국 승자의 법칙은 있어도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게 저자의 결론. 야속하게 말하자면 한국이, 삼성전자가 1위 시장을 계속 이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일본 수출규제를 해결하는 게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인 양 덤벼선 아주 곤란하단 소리기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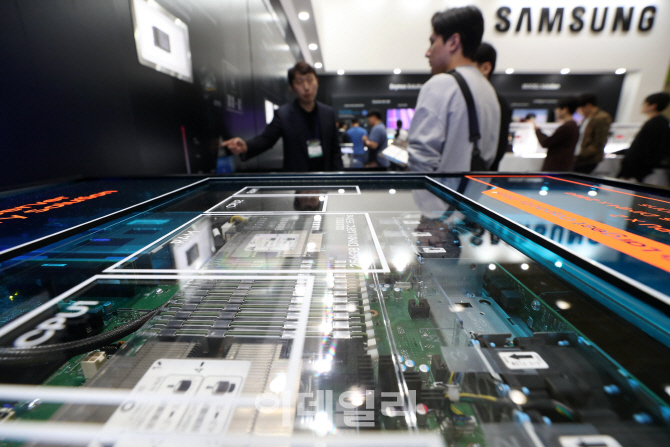


![[단독]대출 74%가 담보·보증대출…위험 피하는 은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154t.jpg)
![퍼렇게 질린 뉴욕증시, 나스닥 2.8%↓…‘MS·메타 과도한 AI투자?[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22t.jpg)
![이번 '이부진 백'도 '조용한 럭셔리'[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102t.jpg)

![남은 건 1㎝ 지문뿐…‘용의자 무죄'에 또 미궁 빠진 살인사건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