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사회적·경제적 어려움과 그에 따른 고립. 누군가는 나이들어 마주하는 가혹한 형벌이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고독·고립과 싸워야 하는 노인들, 그 노인들의 시간들이 덩달아 늘었다. 지난 5월 찾은 파리에선 노인들의 고립을 부수기 위해 교류와 연대를 늘려나가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다.
◇ 민간에서도 나서 ‘노인 고립’과 투쟁
|
그레고리씨의 안내에 따라 둘러본 볼테르가의 PFP 건물 내부는 깔끔하고 쾌적했다.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카페, 무료 식사가 제공되는 식당, 연극 수업과 뜨개질 등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 탁트인 파리시내를 바라볼 수 있는 루프탑 등을 갖췄다. 그레고리씨는 “우리는 불우한 사람들, 특히 노인의 고립과 외로움과 맞서 싸워왔다”며 “노인이 고립에서 탈피해 삶을 즐기고 서로서로, 세대간 어우려져 살아갈 수 있게 연결고리가 돼 준다”고 말했다.
이 단체를 비롯해 ‘파리 솔리데르’(paris solidaire), 비영리단체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동반자파리’(Paris en compagnie) 등 프랑스에선 민간에서도 노인의 고독·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었다. 그만큼 고독·고립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단 얘기이기도 하다. PFP 다른 직원인 메릴씨는 “2021년 실시한 ‘노인의 고독과 고립에 관한 조사’ 결과, 프랑스에선 53만명의 노인이 가족과 친구, 이웃과 접촉이 없는 고립 상태, 즉 ‘사회적인 죽음 상태’에 처해 있었다”며 “노인 200만명은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2019년엔 노인 고립도와 지역과의 관련성을 조사했는데, 파리와 같은 도시 지역은 주민 연대와 이웃관계의 약화로 고립도가 악화했다”며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70%는 서로 유대감을 갖는다고 답했지만 파리 노인은 39%가 친밀감을 갖지 않는다고 여겼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로 ‘노인 고립’ 심화…세대간 연대로 가야
인구는 많지만 서로간 친밀감은 떨어지는 파리에서 특히 노인과의 교류, 연대를 도모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것도 이 영향으로 보인다.
2019년 세워진 ‘동반자파리’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공원 산책, 문화공연장이나 병원 이동 때에 동행자가 되어줘 이동성을 높이고 있다. 전화, 휴대폰 앱, 인터넷 등으로 동행을 신청하면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찾아가 이동을 같이하면서 말동무도 돼주는 식이다. ‘동반자파리’에서 일하는 마리씨는 “파리에선 10명 중 9명 정도의 노인이 혼자 살고 있고, 4명 중 1명은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거나 동기가 부족해 혼자 밖에 나가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들이 안심하고 밖에 나와 의료·행정 일을 보고 일상의 단조로움, 고립을 깨뜨릴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
교류 증대는 인식도 바꾼다. 동반자파리의 2021년 활동보고서를 보면 자원봉사자의 60%는 노인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만족감을 얻었고, 3명 중 1명은 노인들에 대한 시선이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20대 여성 엘리자씨는 “노인과의 상호작용 없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인은 돌봐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그 분들을 도울 때 뿌듯하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서울시는 지난해 봄부터 동 단위로 ‘내곁에 자원봉사’라는 봉사캠프를 꾸렸다. 지난해 106개를 시작으로 올해는 224개 캠프가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하지 못하고 고립감과 외로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필요한 일을 도와드린다”고 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력이 세대간 통합, 연대 강화로까지 이어지기엔 아직 멀었다는 평가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연대의식 수준이 높은 나라인 반면 우리나라는 세대가 분절돼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제도·정책을 세대로 구분해 펴는 등 세대 분절이 구조화돼 있는 상황으로, 세대간 교류를 늘리면서 노인 고립을 풀고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는 건 먼 얘기”라고 꼬집었다.
(통·번역 도움=한국외대 장민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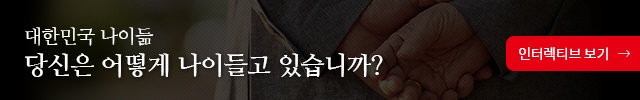





![이러면 잘 자요 영아 엎어놓고 눌러 죽인 원장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2200017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