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이데일리 오현주 선임기자] 본디 태생이 그랬다. 약하디약한 일생이었다. 물이 닿으면 폭삭 무너지고 불이 스치면 흔적 챙기기도 어렵다. 그러니 제대로 주역이었던 적이 없다. 포장·장식·운반 등 일회성이면 족하다 할 역할이었다. 세상의 모든 오브제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미술에서도 다를 건 없었다. 회화든 조각이든 그저 충실한 조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
그런 종이가 세상의 중심에 섰다. 적어도 이 전시에서는 그렇다. 강원 원주 뮤지엄산이 ‘종이가 형태가 될 때’란 테마 아래 펼친 ‘종이조형’ 전이다. 종이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위해 26명의 작가가 나섰다. 김호득·송번수·임옥상·전병현·최병소 등 내로라하는 국내 대표작가를 앞세우고 김도명·이주연·이종한·이지현·송영욱·한기주 등 중견·신예작가가 힘을 보탰다. 평면에 양감을 입힌 부조, 입체조형과 설치 등 거대한 종이작품 39점을 걸고 세우는 큰 판을 벌였다.
‘공간’ ‘소통’ ‘사유와 물성’. 전시를 위해 애써 구분한 세 가지 소주제가 있다. 복잡한 듯하지만 사실 그럴 것도 없다. 종이로 공간을 만들고, 누군가를 불러들여 말을 시키고, 그간 종이로 따질 일은 아니라고 했던 특성을 최대치로 끄집어내고 또 고민하고. 이런 일을 한자리에서 해보자는 거니까.
|
이를 위해 한지·양지·골판지·신문지 등 세상의 종이를 다 모았다. 덕분에 물감만 잘 먹으면 ‘장땡’인 줄 알았던 종이는 특별한 변신을 해낼 수 있게 됐다. 때로는 따뜻한 조명을 품은 집이 되고, 때로는 촉감을 부르는 울퉁불퉁한 동네가 됐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바람처럼 흩날리고, 첩첩이 산을 이루다가, 물이 돼 도도히 흐른다. 장구한 생명력까지 얻어낸 장면. 우린 이제 종이라 쓰고 산이라 물이라 읽는다.
△수천·수만 종잇조각 붙이고 쌓아
거대한 치마폭인가. 언젠가 명창 안숙선이 나선 판소리오페라 ‘수궁가’에서 비슷한 한복치마를 본 적이 있다. 안 명창은 3m 높이에 달하는 푸른의상을 입고 무대에 우뚝 섰었다. 하지만 상상은 거기까지.
가까이 다가가 본 풍경은 전혀 다른 세계다. 벽면에 붙은 작은 창으로 얼굴을 내민 ‘페이퍼맨’이 끊임없이 종이를 토해내는 중이니까. 이주연의 ‘엔트로피컬’(2008)이다. 수천·수만개의 종잇조각을 붙이고 흘려 만든 작품. 메시지는 간결해 보인다. ‘나는 지금 말과 감정, 생각과 정보를 쏟아내는 중’이란 것. 다만 양면의 입장을 동시에 살필 필요는 있겠다. 페이퍼맨이라면 카타르시스가 될 테지만 건너편의 상대라면 적잖은 고통이 될 듯. 하지만 작가의 역설은 한 단계 높은 차원이었다. 미디어시대인 요즘 손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우둔해 보이겠느냐고. 하지만 미약한 종이로 이룬 광대한 상징에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이 또한 큰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
노동집약적인 작업은 이지현도 만만치 않다. 책을 일일이 뜯고 해체한 뒤 다시 구성하는 작업이다. 더 이상 텍스트를 읽는 시대가 아니란 도발이라고 할까. ‘파우스트’를 난도질해 캔버스에 콜라주하기도 하고(‘013OC2627 Dreaming Book: 파우스트’ 2013), 몇 권의 책을 죄다 할퀴고 뜯어내 푹신한 섬유처럼 만들어내기도 한다(‘017OC2403 Dreaming Book: 춘희’ 2017).
200호 규모(260×196㎝)의 캔버스에 10㎝ 미만의 한지막대를 촘촘히 심어낸 서정민의 ‘함성’(2017)은 손끝을 부른다. 갈대나 억새를 스치듯 쓰다듬는 느낌은 바람의 아우성과 다름없다. 조윤국의 ‘상실의 섬’(2016)은 골판지로 빚은 작은 건물 하나하나를 빼곡히 들여세운 빌딩섬이다. 언제든 자발적 단절·합리적 고립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이상공간에 대한 동경이란다.
|
△느릿느릿 걸으며 자연풍경 보듯
압도적인 물량 혹은 기죽이는 수고로움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도 있다. 이곳은 마치 염색천을 널어둔 마당인 듯하다. 가로 2m, 세로·폭 1m의 철제구조물 위에 하늘거리는 물체가 나풀거리고 있으니. 느릿느릿 움직이는 이것의 정체는 한지다. 100여장이 정확히 반씩 접힌 채 나란히 걸려 은근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수묵을 현대적으로 해석했다는 김호득의 ‘겹과 사이’(2017). 주목할 건 작품 한 가지만이 아니다. 살짝 열어둔 창틈으로 불어드는 바람, 통창에 떨어지듯 스미는 햇살, 그들이 만든 그림자까지 전부를 봐야 한다.
|
수백장의 골판지를 쌓아올려 항아리 무리를 만든 작품도 있다. 크고작은 항아리가 써내려간 가족사라고 할까. 김도명의 ‘항아리(가족사)’(2007)는 온전히 포장용 골판지만으로 만든 작품이다. 볼록 항아리는 물론, 그를 도려낸 자리인 듯 안으로 파낸 틀도 세웠다. 항아리 본연의 자세를 위한 퍼포먼스도 겸했다. 흙을 넣고 화초를 심어둔 것. ‘작업은 무릇 자연을 닮아야 한다’는 게 작가의 지론이란다. “작품은 언젠가 흙이 되고 흙은 또다시 나무가 될 거며, 나무는 이내 종이가 될 것”이라고.
|
△종이는 나무로 다시 종이로…돌고 도는 생애
차고 강렬한 물성을 다 거친 종이는 본연의 포근함도 뿜어낸다. 이종한의 ‘갈 곳 없음’(Nowhere·2017)은 조용한 산등성이 마을을 꾸려냈다. 창문과 골목길에 은은한 조명까지 새어나오는 아기자기한 집이 한가득이다. 제목을 의식해선가. 무조건 따뜻해 보이는 작품은 한지를 풀어 염료와 섞은 뒤 한 채 한 채 집을 짓듯이 붙여 만들었다.
전시의 정점은 30여 년 한지작업을 해온 한기주가 찍는다. 종이를 본래의 자리를 되돌리는 작업이다. 나무를 끌로 찍어 파고 그라인더로 갈아낸 후 20여장의 한지를 빈틈없이 눌러내는 ‘한지 캐스팅’이다. 그렇게 빚은 ‘워크-인 비트윈’(2006) 시리즈는 나무의 물성과 그를 굳게 덮은 시간의 단층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어디서부터 나무인지 어디까지 종이인지, 아니 이 둘을 애써 나눈다는 게 소용없는 일이란 ‘무상’에 이르게 하는 작품세계.
|
굳이 한기주뿐이겠나. 전시는 결국 종이가 수시로 내보이는 파괴력을 포착하는 데 공을 들였다. 평면인 줄 알았는데 입체가 되고 외로운 ‘홑’인 줄 알았는데 든든한 ‘겹’이더란 걸 알리는 일이다. 덕분에 ‘재발견’도 모자라 ‘반란·혁명’의 경지에 올라서는 현장. 놓치면 아까울 종이의 부활 장면은 내년 3월 4일까지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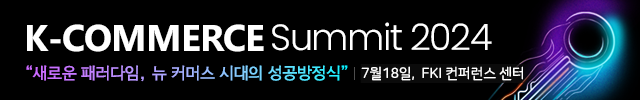









![中 육상 여신, '외모 치장' 일축…100m 허들 최고 기록 경신[중국나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100828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