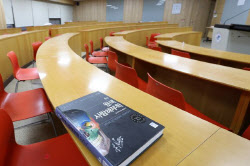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린 법리적인 배경까지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장기 미제사건’이라는 꼬리표가 달릴 만큼 헌재에 접수되고 6년 동안이나 묻어두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에 기대가 작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디에 최종 답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고자 한다. 헌재로서는 50년 전에 이뤄진 역사적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것이다.
|
이에 대해 강제징용 유가족들이 흔쾌히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제 침략기 시절 혹독한 감시의 눈초리를 받으며 피땀을 흘리면서 고생한 장본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청구권 협정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이 막혔다면 그 방법을 찾으려는 것은 당연하다. 당시의 청구권 협정이 이런 문제를 간과한 ‘과잉금지’ 협정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논의가 시작돼야만 한다.
만약 청구권 협정의 내용대로 일본과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 종결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면 우리 정부라도 나서서 부분적이나마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다. 강제징용자 유가족들은 청구권자금 가운데 무상자금 3억 달러는 군인·군속 피해자 보상금 성격이었으므로 유가족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 유보로 논의는 다시 원점에서 맴돌게 됐다. 역사와 현실 사이에서 한·일 관계의 숙제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