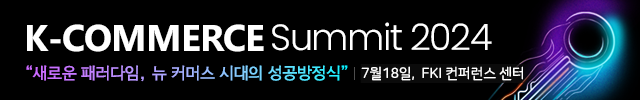“시집값이 8000원(현재 1만 2000원)이니까 권당 인세가 800원, 여기에 판매 부수를 곱하면 8800만원이에요. 시집이 나온 지 7년 됐잖아요. 이걸 7로 나눠 연봉 계산하면…이거 어떡할 거야(웃음).” 책 ‘문학하는 마음’(2019 ·제철소)에서 저자인 김필균 편집자와 박 시인이 속 터놓고 나눈 출판계 뒷얘기다.
저자는 통상 책값의 10%를 인세로 받는다. 1만 5000원짜리 책 1쇄 3000부가 팔리면 작가 몫은 450만원. 책을 쓰는 데 걸리는 물리적 시간부터 이에 필요한 검증과 사유, 기타 투자에 비하면 많지 않은 금액이다. 작가 상당수가 투잡을 뛰거나 강연·기고료와 심사료, 지원금 등 부수입원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이후 행보는 정반대로 흘렀다. 문체부는 번역출판지원사업이 부실하다며 한국문학번역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2021년 번역 지원을 받은 14건 작품 중 1건만 현지에 출판됐다는 비판이다. 이는 번역출판에 대한 몰이해를 그대로 드러낸다. 번역하고 해외 출판사를 찾아 출판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데, 2년도 안 된 시점에서 이를 문제 삼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올해 13만명이 찾은 서울국제도서전도 문체부는 문제 삼았다. 민간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가 40억원 예산 중 약 7억 70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는 도서전에서 ‘이권 카르텔’이 감지됐다며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했다.
문체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한 해 60억원 규모로 운용해 온 ‘국민독서문화 증진지원’ 사업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예산 11억원을 통째로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국민에게 개방한 청와대 예산엔 95억원 늘어난 330억원을 투입, 대통령 해외순방 취재와 외신 오보대응 등 미디어홍보에 130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문단 및 출판계에서는 즉각 “국민에 책을 읽지 말라는 정부”라고 일갈했다. 문체부가 요 몇 달 새 벌인 일련의 일들이 예산 삭감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윤 정부는 13일 2차 개각을 단행했다. 예상대로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가 문체부 장관에 내정됐다. 청문회가 남아 있긴하지만 2011년 1월 문체부 장관에서 물러난 후 12년 8개월여 만에 복귀는 기정사실이다.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다. ‘구관이 명관’이 되려면 출판업계가 분투 중인 현장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현장에 오래 있었던 그인 만큼, 언어를 유통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달라는 당부다. 출판은 단지 작가의 생계 도구만이 아니라 수많은 산업을 견인하고, 시대를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