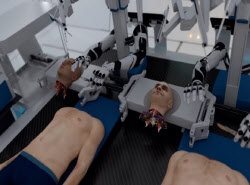현재 콩고 정부는 외국 기업 등과 합작 투자한 모든 광산에 대해 전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콩고 정부 관계자는 “어느 계약도 콩고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더 많은 일자리와 수익을 위해 수출 규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단순 채굴 안돼”…수출 규제 활용 고부가가치 생태계 구축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시간) 콩고의 변화를 소개하며 “구리, 코발트, 니켈 및 리튬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핵심 광물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가 이들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들의 운명을 변모시키고 있다. 역사적으로 저개발 국가였던 곳이 이젠 원자재 초강대국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혜택을 받은 국가는 아직까진 핵심 원자재를 적극 생산하는 소수 국가로 국한된다. 코발트는 콩고가 전 세계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니켈은 상위 3개국(인도네시아·필리핀·러시아)이 3분의 2를 생산한다. 리튬도 상위 3개국(호주·칠레·중국)의 생산량이 90% 이상에 달한다.
시장 선점 등을 위해 친환경 전환을 서두르는 서방 선진국들은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자원 부국과의 관계 개선에 열중하고 있다. 최근엔 미·중 패권 다툼과 맞물려 자원 부국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등의 생산·수출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서방 국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구애에 나서고 있어서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중국을 거치지 않고 주요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을 물색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경제 발전 기회로 보고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수출 규제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생태계까지 요구하는 식이다. 인도네시아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전 세계 니켈 생산의 거의 절반을 생산하는 인도네시아는 2014년 가공하지 않은 니켈에 대해 수출을 금지했고, 그 결과 국내 제련 산업의 광범위한 발전을 이끌어냈다. 또 테슬라, 포드, 현대차 등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수많은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을 구축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한 차례 성공을 경험한 인도네시아는 니켈 원석 수출 금지에 이어 알루미늄의 핵심 소재인 보크사이트 수출도 통제하기 시작했다. 또 올해부터 미가공 구리 광석 등의 수출을 금지하려던 계획을 내년 5월로 연기하되 최고 10%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100년 전 서방 선진국들이 썼던 정책에서 배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니 성공에 ‘너도나도’ 수출 규제…“권력·부 재구성 진행중”
인도네시아를 따라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짐바브웨와 나미비아는 리튬 수출을 금지하고 자국 내에서만 제련을 허용했고, 멕시코는 올해 2월 리튬 광산을 국유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칠레는 자국 국영기업과 합작으로만 민간기업에 리튬 채굴을 허용하는 등 국가 통제를 강화했다. 또 자국 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리튬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에는 우대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칠레·볼리비아·아르헨티나 등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같은 카르텔 성격의 국제기구 설립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리튬 등의 광물은 실제 생산량과 달리 지질학적 매장량 측면에선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돼 있어 석유·가스와 같은 카르텔을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배터리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배터리 재료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 등도 카르텔 형성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를 감안해도 희귀 광물 생산이 활발한 국가들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30년까지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려면 리튬 시장 규모가 현재보다 3배 이상 커져야 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구리 공급량도 240만톤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FT는 “희귀 광물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전 세계 에너지 경제와 지정학 모두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에너지 전환으로 20세기를 지배했던 권력과 부의 시스템이 재구성되고 있다”며 “식민 시대 서구 열강의 착취 희생자였던 일부 국가가 이제는 스스로 자국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들 국가는 광물 채굴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