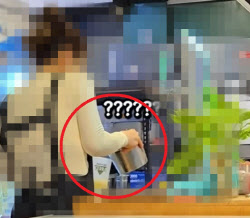이 기사는 2024년06월21일 09시10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메신저리보핵산(mRNA) 신약 개발의 핵심이 되는 2세대 지질나노입자(LNP)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자체적으로 충분한 효율을 갖춘 LNP를 확보했다. 이 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와 함께, mRNA 백신 및 희귀질환 분야 신약 개발에 도전하겠다.”
20일 정재욱 GC녹십자 R&D 부문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확보한 mRNA 및 LNP 관련 기술은 글로벌 기업들이 상용화에 성공한 제품에 들어간 기술과 대비해도 경쟁력이 충분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
회사는 지난 2023년 3월 캐나다 아퀴타스 테라퓨틱스(아퀴타스)로부터 mRNA 전달용 지질나노입자(LNP) 기술을 도입했다. 아퀴타스는 미국 화이자의 관계사이다. 이 기업의 LNP가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코미르나티’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기술제휴 작업과 별개로 GC녹십자는 KAIST 등과 협력해 인공지능(AI) 기반 2세대 LNP 확보에 매진해 왔다. 회사의 전체 연구개발 비용 중 mRNA 및 LNP 관련 비중은 2021년 5%였지만, 2022년 17%→2023년 23%(310억원대)등으로 크게 상승한 바 있다.
이를 통해 GC녹십자는 상용화된 제품에 쓰인 1세대 LNP 대비 간 내 전달률이 90배 향상된 LNP 라이브러리 등을 확보했다. 또 회사는 설계한 mRNA 염기 서열(5′-UTR 및 3′-UTR)의 번역 효율성(체내에서 단백질로 발현되는 비율)도 미국 모더나나 독일 바이오엔텍 등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 부문장은 “아퀴타스와의 기술도입 계약 당시 가장 핵심이 되는 LNP 기술이 없었다. 빠른 개발을 위해 검증된 기업의 LNP를 가져오는 전략을 택했다”며 “하지만 최근 자체적으로 LNP 기술을 확보했다. 이는 그 자체로 특허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GC녹십자는 자체 LNP에 대해 원숭이를 대상으로 비임상 단계에서 독성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 부문장은 “올해 말에 (자체 LNP의)독성 데이터가 나오면 내년 초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기업들과 우리의 LNP를 활용해 공동 연구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GC녹십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mRNA 및 LNP 등 기술을 바탕으로 인플루엔자(독감) 4가 백신 후보물질 ‘GC4002B’의 비임상을 수행 중이다. 이와 함께 회사는 숙산알데이드탈수소효소결핍증(SSADHD) 대상 mRNA 신약 후보물질 발굴 과제도 병행하고 있다.
정 부문장은 “인플루엔자 시장의 다변화를 고려해, 우리 기술로 만든 mRNA 백신 후보물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미 화이자와 바이오엔텍 등이 공동으로 발굴한 mRNA 기반 인플루엔자 백신 후보물질 ‘PF-07252220’의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년 인플루엔자의 유행종이 달라지는 만큼 지속적인 개발 수요가 있는 분야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SSADHD나 리소좀 저장 장애(LSD) 등을 오래 연구해왔고. 희귀 질환 중에는 mRNA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mRNA 기술로 개발할 첫 타깃 적응증을 SSADHD로 선정했다. 현재는 다양한 기초 연구결과를 쌓고 있는 단계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 전략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GC녹십자는 mRNA 신약의 설계부터 제조까지 가능한 전주기 플랫폼을 마련하는데도 성공했다. 회사가 보유한 전라남도 화순 백신공장에 파일럿용 mRNA 제조소를 건설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곳은 mRNA 관련 연구용 물질부터 상업화를 위한 임상 2상 단계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문장은 “mRNA 분야 글로벌 기업인 모더나 등과 비교할 때 (우리는) 상당한 편차가 있는 후발주자다”며 “대내외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mRNA 플랫폼을 적용할 과제를 찾고 적극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