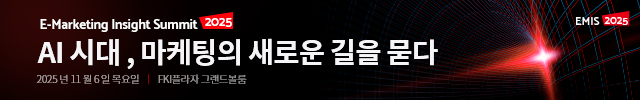|
[이데일리 오현주 선임기자] 정착한 것은 하나도 없다. 톱니바퀴인지 잘린 철판인지 온갖 기계서 떨어져 나온 듯한 조각이 떠돌고, 뾰족한 알약처럼 생긴 색색의 볼이 둥둥 떠 있다. 정체 모를 이 조직체에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부유’(Floating·2016)다.
서양화가 제유성(54)은 무의식 쌓기를 하려 했나 보다. 150호의 거대한 화면은 온통 그의 숨은 스토리를 품고 있다. “캔버스는 나의 몸에 잠들어 있는 기억의 조각을 깨우고 심연의 무의식으로부터 비정형의 모양과 이야기를 끄집어낸다”고 했다. 그래선가. 정교하게 쌓은 다채로운 색감의 레이어는 꼬리에 꼬리를 문 의식의 겹침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그림 앞에 선 이들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진 않는다. 그저 시각적 즐거움을 누리라고, 상상을 확장할 수 있으면 그뿐이라고.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로 아트파크서 여는 개인전 ‘원형’(Prototype)에서 볼 수 있다. 캔버스에 유채. 182×227.3㎝. 작가 소장. 아트파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