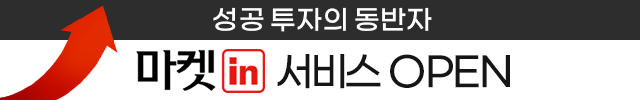|
화장품은 FDA 품목이라 관세 부과 대상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최근 한류 열풍에 K뷰티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세 폭탄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지난해 K뷰티의 대미 수출액은 17억 1000만달러로 프랑스(12억 6300만달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아모레퍼시픽(090430), LG생활건강(051900) 등 대기업뿐 아니라 인디 브랜드도 미국은 주요 시장으로 꼽힌다.
K뷰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명백한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공존한다. 단기적으로 정책 변화에 따른 유통 구조 불안정이라는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가격 민감도가 높은 미국 내 드럭스토어·대형 유통 채널에서 K뷰티 제품의 매력이 일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중국 내수 침체에 미국을 대체 시장으로 공략해온 K뷰티 업계 입장에서 이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상황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관세 영향은 비단 한국만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K뷰티가 그동안 가격만을 경쟁력으로 내세우지 않았던 점도 있다. 품질력과 기능성으로 충분한 차별화에 나서왔다는 이야기다. 화장품은 관세가 붙는 기준인 수입 원가가 낮아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를 현지 물류 마케팅비 효율화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다른 주요 수출 국가도 비슷하게 관세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경쟁 환경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품질이 좋고, 혁신적인 제품군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시 가격 인상 또는 프로모션 비용 관리 등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생활건강 관계자 역시 “화장품 관세율이 최종 확정되면 이에 대응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에 생산 인프라를 갖춘 곳은 호재가 될 수 있다. 코스맥스(192820)와 한국콜마(161890)가 대표적이다. 코스맥스는 2013년 뉴저지에 미국 법인을 설립했다, 연 2억 8000만개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 한국콜마는 2016년부터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화장품 공장을 인수해 가동 중이다. 상반기 제2공장도 본격 가동한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향후 고객사가 희망하면 미국 생산 이관 등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가도 관세 부과 여파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은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 현지의 제품 판매가는 상당수가 10~30달러 수준”이라며 “관세가 부과돼도 경쟁력이 떨어질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오히려 품질·혁신 제품의 소비 증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중소·인디뷰티 업계는 위기감이 짙은 분위기다. 자본 여력이 크지 않은 만큼 마진 조정 등에서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어서다. 물류나 마케팅 등 비용 효율화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기능성 제품군이 적은 것도 문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27.7% 성장했다. 특히 미국의 비중이 46.5%로 전체 수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김주덕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교수는 “현지 공장 여부, 기업 규모에 따라 관세 여파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규모가 큰 곳은 비용 효율화를 경쟁력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재무 구조가 어려운 곳은 대처의 선택지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직 소비재 쪽에서 구체적인 관세 부과율이 나오지 않았지만 만일 26%가 현실화면 중소·인디 브랜드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