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하윤 미술평론가] 치맛자락을 살포시 쥐고 조신하게 걷던 시대였다. 결혼은 집안이 정해주는 대로 따르는 것이 순리고, 여자는 정숙하게 남편의 그림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관념이 당연하던 시절. 그런 시대에 사뭇 다른 길을 걸은 여인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쓴 채 유학길에 올랐고,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세계를 용감하게 열어젖혔다. 바로 나상윤(1904∼2011)이다.
나상윤이 미술에 발을 들인 것은 남편을 통해서였다. 그의 남편은 훗날 한국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는 도상봉(1902∼1977)이다. 이 부부의 러브스토리는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극적이다. 도상봉은 일본에서 유학하던 중 방학을 맞아 고향 함경남도 홍원을 찾았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 직접 연극을 공연했다. 그가 맡은 배역은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 무대에서 열연하던 도상봉을 맨 앞줄에서 바라보던 이가 바로 나상윤이었다. 배우와 관객으로 마주한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게 빠졌고 사랑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러나 이들의 자유로운 연애는 부모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경망스럽다” “정해준 짝을 기다려야 한다”는 꾸지람이 뒤따랐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다. 도상봉은 연애를 허락받기 위해 단식투쟁까지 감행했고 결국 둘은 도망치듯 고향을 떠났다.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일본으로 향하는 배에 함께 올랐다.
1920년대 파격 누드화…서양미술사조 좇지 않은 서양화
일본 땅에 발을 디딘 나상윤은 그곳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 그림이었다. 도상봉이 캔버스 앞에 앉아 고요히 붓을 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그는 자연스레 미술에 매혹됐고, 1925년 도쿄여자미술학교에 입학한다. 여성이 전문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드물던 그 시절, 그것도 미술이라는 분야에서 정식교육을 받겠다고 나선 선택은 당차고도 대담했다.
나상윤은 곧 두각을 나타냈다. 당시 지도교수로부터 ‘천재’란 찬사를 받았고, 그것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유학시절 완성한 작품 ‘동경제대 구내풍경’(1927)이 1930년 ‘제9회 조선미술전람회’에 당당히 입선했다. 당시 조선미술전람회는 식민지 조선 미술계에서 유일하게 공신력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통로였다. 여기에 학생 신분으로 입선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성과 이상이었다. 나상윤의 가능성과 실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나상윤의 작품은 많지 않다. 유화 3점, 데생 10점 정도가 전부다. 숫자로만 보면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식민지의 긴 그림자와 이어지는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작품이 워낙 많았던 시대였음을 생각하면 이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는 것이 오히려 기적 같다. 특히 한국 근대미술에서 여성화가의 작품은 더욱 귀하다. 그 시대엔 직업으로서 그림을 그리는 여성 자체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 작품의 진정한 의의는 기술이 아닌 태도에 있다. 나상윤이 이 그림을 그렸던 1920년대, 누드화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화가 김관호(1890∼1959)가 한국인이 그린 최초의 누드화(‘해질녘’ 1916)로 논란을 빚은 지 10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김관호는 당시 일본 최고의 미술전시 행사였던 ‘문부성미술전림회’에서 무려 특선이란 큰상을 수상했음에도 작품이 여성 누드화라는 이유로 국내 신문에 실리지 못했다. ‘여인들이 벌거벗은 그림인고로 사진으로 게재치 못함’이라는 단 한 줄의 설명이 그림을 대신해 지면을 채웠다.
그런 시대에 조선에서 태어난 한 젊은 여성이 여성의 벌거벗은 몸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렸다는 것은 그 자체로 파격이었다. 어쩌면 ‘누드’에서 느껴지는 어색한 붓질과 긴장감은 낯선 감정을 마주한 나상윤의 심리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른다. 아무리 신여성이라 해도 벗은 타인의 몸을 찬찬히 눈으로 훑고 손끝으로 옮기는 일은 여전히 불편하고 생소했을 테니까.
더구나 나상윤이 그린 여성은 실물 그대로의 모습이다. 서양화의 오랜 전통이 남성 관객의 눈을 의식해 여성의 몸을 이상화했다면, 나상윤은 처진 살과 무심한 표정을 가진 여인을 정직하게 그려냈다. 보는 이를 매혹하기보다 자기 세계에 몰두한 모습.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던 나상윤을 닮았다. 기술적 완성도라는 기준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누드’는 오히려 그 어색함 속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시선을 드러낸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용기의 흔적, 그것이 이 작품의 진짜 가치다.
근대 대표작가 도상봉의 오랜 동료이자 냉철한 비평가로
일본에서 새로운 소재와 기법을 부지런히 익히던 나상윤과 역시 그림에 매진하던 연인 도상봉은 졸업 후에 양가의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귀국 후에는 경성의 명륜동에 신혼집 겸 아틀리에를 마련했다. 부부는 그곳에 ‘숭삼화실’이란 미술 교육 공간을 열었고 중고생에게 서양화를 가르쳤다. 1933년에는 여자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당시 나혜석과 함께 한국 여성 서양화의 선구자로 꼽히던 나상윤은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더 이상 붓을 들지 않았다. 화가라기보다는 화가의 아내로 조용히 남편 곁을 지켰다. 도상봉은 이후 한국 도자기를 소재로 한 정물화로 미술사에 이름을 남겼지만 그 도자기를 먼저 수집하고 사랑한 이는 다름 아닌 나상윤이었다. 도상봉의 작업실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그였고, 완성된 그림에 대한 그의 반응은 도상봉에게 가장 중요한 평가였다. 아무 말이 없으면 ‘아직 부족하다’는 신호였고, “좋다”는 말이 나오면 도상봉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외출에 나섰다. 자신의 이름으로 그림을 그리는 대신 나상윤은 이렇게 도상봉의 그림 뒤에서 가장 예리한 시선으로 함께했고, 남편의 작품을 깊이 이해하며 남편의 세계를 지지했다. 나상윤은 말하자면 도상봉의 가장 냉철한 비평가이자 가장 오랜 동료였다.
|
2011년 10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나상윤은 오랜 세월 ‘화가의 아내’로 불렸지만 예술은 멈추지 않았다. 붓을 내려놓은 뒤에도 일상 속에서 미감을 가꾸며 남편의 작품을 따뜻한 눈빛과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지했다. 그러곤 그렇게 그는 삶 자체를 예술로 빚어낸 미술의 선구자로 우리 곁에 남았다.
△정하윤 미술평론가는…
1983년생. 그림은 ‘그리기’보단 ‘보기’였다. 붓으로 길을 내기보단 붓이 간 길을 보려 했다는 얘기다. 예술고를 다니던 시절 에른스트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에 푹 빠지면서다. 이화여대 회화과를 졸업했지만 일찌감치 작가의 길은 접고, 대학원에 진학해 한국미술사학을 전공했다. 내친김에 미국 유학길에 올라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중국현대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한 이후 연구와 논문이 주요 ‘작품’이 됐지만 목표는 따로 있다. 미술이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란 걸 알리는 일이다. 이화여대·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미술교양 강의를 하며 ‘사는 일에 재미를 주고 도움까지 되는 미술이야기’로 학계와 대중 사이에 다리가 되려 한다. 저서도 그 한 방향이다. ‘꽃피는 미술관: 가을·겨울’(2025 출간 예정), ‘꽃피는 미술관: 봄·여름’(2022), ‘여자의 미술관’(2021), ‘커튼콜 한국 현대미술’(2019), ‘엄마의 시간을 시작하는 당신에게’(2018) 등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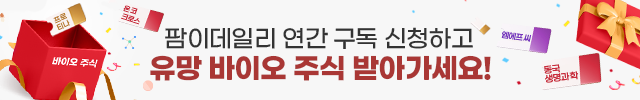












![정우성, 비연예인 女와 혼인신고 마쳤나…소속사 측 사적 부분 답변 불가 [공식]](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8/PS2508050006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