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본부장은 “7월 초쯤 인천시교육청과 교원단체가 꾸린 진상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순직 신청을 더 늦출 수는 없었다”며 “법적으론 유족이 신청 주체이지만, 교육청이 도와준 덕에 접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교사의 순직은 유족이 신청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교육지원청은 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넘기고, 공단은 사실관계와 추가 조사를 거친다. 최종 결정은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맡는다. 만약 불인정될 경우, 유족은 재심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입증’이다. 김 본부장은 “학부모 민원, 극심한 스트레스 같은 사안에 대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면 경찰 조사나 교육청 조사 결과가 필요한데, 이를 유족이 혼자 준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녀를 갑자기 잃은 유족이, 법률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감정 없이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순직 심사 구조는 광복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며 “교사들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업무를 감당했는지에 대한 조사·입증 과정에서 교육청 등 기관의 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이 직접 법률적 소명을 떠안는 지금의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의 구조 자체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 본부장은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주로 일반직 공무원, 군인, 경찰 중심의 사례를 다루기 때문에 교사의 업무 환경이나 정서적 노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교원 출신 위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심의가 열려도 유족이나 변호사와 위원이 같은 공간에서 대면하지 않고,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형식적으로는 공정성을 위한 장치지만, 실제로는 교직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조사 단계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단은 접수된 순직 신청 건에 대해 자체 조사관을 배정해 현장 사실을 확인하는데 이 조사관의 전공이나 경력이 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본부장은 “현장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도 중요하다”며 “교사 업무를 경험하지 않은 조사위원이 업무 스트레스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조사단과 심의위원회에 교원 출신 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구조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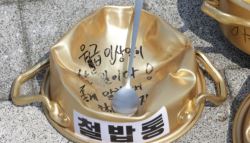
!["내 번호 없네?"…잠든 전 남친 살해한 '16살 연상녀'[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7/PS25071501303t.jpg)


![물폭탄 쏟아진다 최대 200mm…중부지방 집중호우[내일날씨]](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7/PS25071501277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