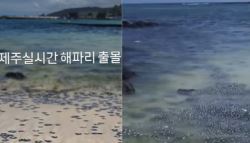재계가 올 하반기 최대 수출 리스크로 ‘트럼프 관세정책’을 꼽았다. 기업 대다수는 미국의 관세 인상률이 15%를 넘으면 감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10% 미만이어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많았다. 이는 지난주 한국경제인협회가 10대 수출 주력 업종에서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을 추려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지금 한미 간에는 몇 가지 현안이 겹쳐 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과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1순위는 두말할 나위없이 관세협상에 둬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종잡을 수 없는 정책으로 무역질서를 흔들고 있다. 그는 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까지 3주가량 연장하되 우방 캐나다에 35% 관세율을 통보했다. 캐나다가 자신의 관세 정책을 고분고분 따르지 않자 본때를 보였다. 또 트럼프는 브라질 내정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관세율을 당초 10%에서 50%로 높였다. 다행히 한국에 대해선 종전 25% 관세율을 유지했으나 긴장을 풀 순 없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리스크’는 되도록 빨리 해소하는 게 상책이다.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출 전략을 짤 수 있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미 간 또 다른 현안으로 눈길을 끈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관세와 방위비 압박을 푸는 데 힘을 집중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다.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전작권 전환은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이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 관세와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한 뒤 별도 사안으로 시간을 두고 풀어가는 게 옳다.
상법 개정에서 보듯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발을 옥죄는 법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 마당에 트럼프발 고율 관세까지 겹치면 기업으로선 엎친 데 덮치는 격이다. 관세 협상은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미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플랫폼법 제정을 보류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대신 국내외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다스리면 된다. 관세 협상 시한은 채 20일도 남지 않았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도 그 결과에 달렸다. 정부는 관세 이슈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