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제공] '히말라야가 높을까, 골수이식이 높을까? 그래도 뭔가 해보고 죽는 게 낫겠지.'(2007년 5월 1일) '새벽에 골수이식 병동에서 혼자 레슬링 자세를 잡아보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허공을 붙잡고 있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2008년 5월 15일)
레슬링 자유형 74㎏급 김형수(21·대덕대 2)의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10여년간 백혈병의 일종인 '재생불량성빈혈'(골수에서 피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병)을 앓았지만 국가대표가 돼 태극마크를 달겠다는 꿈으로 병마(病魔)와 싸워왔다.
다행히 지난 연말 완치 판정을 받았다. 지난 25일 대전 대덕대학교 레슬링연습장에서 만난 그는 밝게 웃으며 금빛 메달 하나를 기자에게 보여줬다. "(백혈병) 완치 메달이에요. 여태껏 받은 메달 중에서 가장 값진 메달입니다."
◆레슬링으로 버텼다
어려서부터 코피가 잘 안 멎고 멍이 쉽게 드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던 김형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백혈병 선고를 받았다. 아버지 김건성(48)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어린 아들은 오히려 흔들리지 않았다. 약물치료를 받으면서도 씨름을 배웠고 초등학교 6학년 때엔 전국소년체전에서 개인전 55㎏급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아픈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더 독하게 운동을 했다"고 말했다.
레슬링을 시작한 것은 수성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였다. 백혈병 때문에 남들처럼 훈련을 못하면서도 김형수는 중3 때인 2003년 문광부장관기 등 전국레슬링선수권대회 69㎏급에서 2번 우승을 했다. 병 탓에 체중 조절을 못해 고등학교 때는 1m70에 불과한 키로 91㎏급까지 체급을 올려 대회에 출전했지만 3위 이하로는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 "병만 없었으면 올림픽 금메달감"이라는 주변의 안타까움이 쏟아졌다. 하지만 레슬링은 김형수가 병마와 싸울 수 있게 해준 꿈이었다.
◆병(病)에게 배웠다
경성고 2학년 때 큰 고비가 왔다. 병이 악화됐고 계단 몇 칸만 올라도 숨이 차고 어지러웠다. 밤새 잇몸에서 흐른 피로 베개가 흥건히 젖을 정도였다. 혈액 응고를 돕는 혈소판 수치는 정상인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병원에선 "당장 골수이식을 안 받으면 죽을 수도 있다. 수술을 해도 살 확률은 60%"라고 했다. 대만의 한 여성으로부터 골수를 받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또 다른 투병생활이 시작됐다. 면역력이 모자라 집, 병원만 오가야 했고 몸이 붓고 구토를 하는 부작용도 심했다. 부모 몰래 레슬링 경기장을 찾았다가 바이러스가 옮아 두달 동안 병원 독방 신세를 지기도 했다.
그랬던 김형수의 목에 지난해 12월 '완치 메달'이 걸렸다. 올림픽 메달을 향한 꿈이 완치 메달의 기적으로 나타났다고 믿는 그는 오는 6월 대학선수권대회에 나선다. 운동량이 부족해 좋은 성적을 올릴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올림픽을 꿈꾸는 그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병이 저에게 '결코 포기하지 마라' 했어요. 만약 병이 없었다면 꿈을 위해 뛰는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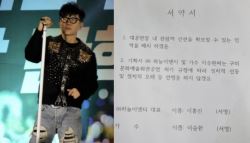

!['7억8000만원' 로또 1등 남편 살해한 여성이 한 말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4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