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CN 업계에서는 그동안 여러 기업들이 상장에 도전했지만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는 없다. 최초 상장으로 언급됐던 트레져헌터는 적자 누적으로 인해 중도 철회했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지난해 말 주관사를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상장을 준비 중에 있으나 수익성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업계서 드문 흑자 기업…새 수익구조 만들어
일반적으로 MCN은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 등 방송인의 소속사 역할을 하면서 광고 매출을 주 수익원으로 운영된다. 보유한 방송인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수익도 감소하는 구조로, 새로운 성장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업계 전반이 경쟁력을 잃었단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레페리는 그 중 유일하게 연간 흑자를 낸 MCN이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348억원으로 전년 동기(232억원) 대비 50%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약 4억원에서 4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2021년도부터 안정적인 흑자를 유지하고 있던 레페리는 작년 인테리어 기업 ‘알렉스 디자인’ 등을 인수하고, 오프라인 커머스 공간인 ‘셀렉트 스토어’와 시너지를 내는 과정에서 실적이 우상향한 것으로 분석된다.
|
전체 매출액에서 상품매출이 줄고 제품매출이 늘어난 점도 고무적이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직접 제조한 것을 제품, 다른 회사가 만든 제품을 팔기 위해 사들인 것을 상품으로 분류한다. 제품매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원가구조 개선이 쉽고,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프랜차이즈 기업 중엔 상품매출에 의존하다 성장세가 꺾인 사례도 있다.
신한금융투자·아주IB·NH투자증권·GS홈쇼핑 등 FI
이에 따라 레페리에 초기부터 투자해온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레페리는 2015년부터 신한금융투자·아주IB·NH투자증권·GS홈쇼핑·카카오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마지막 투자 라운드였던 지난 2019년 100억원 규모 시리즈B 라운드에서도 신한금융투자·아주IB·NH투자증권·GS홈쇼핑은 후속 투자에 참여하며 인연을 이어갔다.
레페리의 주요 주주로는 지난 2015년 레페리를 인수한 트레져헌터(29.78%)를 제외하고는 재무적투자자(FI)들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신한컨슈머신기술투자조합(9.98%) △GS홈쇼핑(9.98%) △엔에이치-아주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9.35%) △유니온미디어앤콘텐츠투자조합(5.74%) △카카오인베스트먼트(3.42%) 등이다.
증시 안착을 위해 남은 건 투자자들에게 레페리의 독자적인 사업모델을 설득시키는 것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 MCN 기업들이 수익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취약한 수익 구조로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다”며 “비즈니스 모델은 각 회사마다 다르지만 소속 크리에이터에 좌우되는 면이 있어 해소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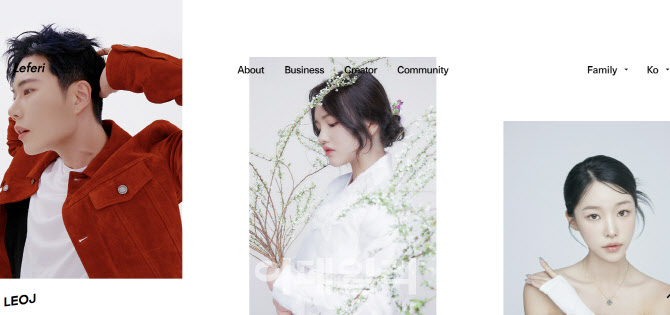




![경찰, 승진 지역 내 서장 역임 1회 제한 없앤다[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10129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