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철 순천향대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이번 구조 전환은 정형외과와 같은 다빈도 진료과를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는 수술 수요가 많은데 중증 질환군 비중이 작다는 이유로 병원 내에서 인적·물적 지원이 우선순위서 뒤로 밀린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환자들은 스스로 경증 질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치료 실패 후 상급병원에 전원 되는 경우가 많고 환자들은 여전히 대학병원에서의 치료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척추, 인공관절, 골절 등 정형외과 주요 수술이 동네 의원이나 2차 병원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환자의 선택권과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형외과 분야가 필수의료임에도 불구, 건강보험에서 원가 이하의 수가를 지급해 수술하면 할수록 적자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한준 중앙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정형외과 수술은 재료비와 인건비 대비 평균 수익률 -52.1%로 수술 대부분이 적자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형외과 수술은 다양한 수술 기구와 첨단 치료 재료를 사용하며, 의료진 다수가 협업하는 노동집약적 진료인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형외과 분야는 건강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치료재료가 많아 일회용 재료를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한준 교수는 “관절경 수술 재료는 일회용 비용(100~120만 원) 대비 수가 보상은 40만 원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한승범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은 “특히 척추 재수술 등이 중증 분류가 안 돼서 개원가에서는 수가가 낮고 수술이 어려워서 하지 않으려 하고 대학에서는 경증으로 분류돼 진료할 수 없다”면서 “정부 의료개혁의 큰 취지는 동감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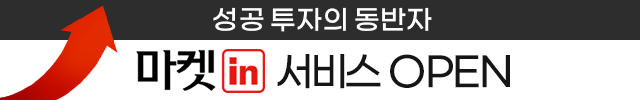
![[단독]與주장 '이재명 파기자판' 불가능..2심 무죄→형확정 전무](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3/PS25033000144t.jpg)
!['월세 1억3000만원' 내는 BTS 제이홉…부동산 투자 보니[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3/PS25033000095t.jpg)
![사라진 치매 노인…수백 개 CCTV서 1초 만에 찾았다[AI침투보고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3/PS25033000099t.jpg)
![실험적인 맛 삼양 비빔면은 다르네…'민초단' 저격 나섰다[먹어보고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3/PS2503300007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