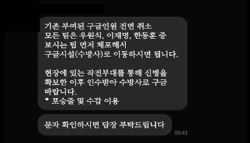|
한미 정상이 지난 주요 20개국(G20)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서울 및 워싱턴 초청장을 다시금 발송하면서 공은 김 위원장의 몫이 됐다. 김 위원장의 ‘뒷배’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를 확인하면서 대화 국면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지부진한 북미 협상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나란히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공조를 확인하면서 김 위원장도 서울을 방문할 수 있는 명분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서울 방문을 통해 어떤 성과를 손에 쥐고 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 실익이 답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남북 정상은 올해 이미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남북 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 거꾸로 보자면 북미 관계의 진척 없이 남북 정상이 만나 새롭게 내놓을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 북측 철로 경의선·동해선에 대한 공동조사가 한창이지만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종전선언 등 성과에 비하면 미미하다.
물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계기로 답보 상태이던 북미 협상 과정을 다시 견인할 동력을 얻는다면 김 위원장으로서는 체면을 세울 수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4차 남북 정상회담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중재자 역할을 다시 수행하는 셈이다.
더욱이 북한을 국제 사회에 ‘정상국가’로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김 위원장에게는 문 대통령과 약속한 연내 서울 답방은 정상국가 지도자의 이미지를 과시할 더없는 기회다. 우리는 물론, 미국과 전세계에 ‘약속을 지킨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 청와대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꼭 약속을 지켰다”며 결정을 종용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북한은 이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판문점에서 북미 막후 채널이 재가동된 사실이 포착되면서 북미 관계 진전과 이와 연계한 남북 교류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그간 최일선에서 북한과 협상해 오던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KMC) 센터장이 지난 3일 판문점에서 북측 인사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앤드루 김 센터장은 앞서서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길 초석을 닦는 등 북한과의 잦은 접촉을 해왔다. 이번에도 2차 북미정상회담과 정상회담에 앞선 고위급 회담의 일정 및 장소, 의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스럽게 김 위원장의 방남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4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하나는 약속을 이행한다는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등등 관련된 진정성을 입증하는 그런 행위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설명을 들어야한다. 실리 면에서도 와야 되고 명분 면에서도 와야 되는 상황”이라며 “12월 17일이 김정은 위원장 아버지 기일이고 그 다음 20일부터 일정이 꽉 차있다. 18~20일이 비워졌는데 그때 올라오지 않겠는가”라고 내다봤다.



![한덕수 국회 탄핵결정 존중…직무정지 하고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전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70096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