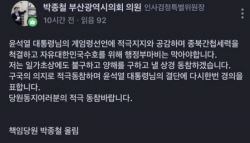|
차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오화경(사진) 하나저축은행 대표의 발언이다. 오 대표는 13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직 관료출신이 회장으로 온다고 해도 예전 근무했던 후배나 동료와의 개인적 소통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문제해결능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가 차기 회장에 ‘힘 있는 관료’를 선호한다는 시각에 대한 반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 20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 선거 일정에 돌입한다. 이달 20일 종료되는 박재식 현 저축은행중앙회장의 후임자를 뽑기 위해서다. 후보군은 크게 3인으로 압축되는 모양새다. 관 출신으로는 이해선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과 정완규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업계 출신으로는 오 대표가 유력후보로 꼽힌다.
오 대표는 “회장 연봉의 50%를 반납해 그 돈으로 각 부분의 전문 자문역을 두고 필요하면 로펌을 써 대관업무에 활용하겠다”며 “이런 방식으로 저축은행 업계의 중요 과제에 대해 명분을 만들도 여론을 형성해 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기업에서 목표지향적 과제를 해결하고 조직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저축은행 산업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중앙회 조직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며 “지방저축은행 6년과 서울저축은행 대표 4년 등 총 10년간 저축은행을 이끌고 서울지역 저축은행 대표인 서울지부장을 2년하면서 느낀 것이 많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2012년부터는 청주의 아주저축은행 대표를, 2018년부터 서울의 하나저축 대표를 역임했다.
오 대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저축은행의 양극화 해소 및 타 업권 대비 엄격한 규제 완화 이슈 등을 들었다. 오 대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저축은행의 자산과 수익 비중이 전체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간 양극화가 심하다”며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강화된 규제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아 영업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했다.
가령 저축은행의 실질적 경쟁자인 상호금융의 예금보험료(예보율)이 0.2%인 데 반해 저축은행은 현재 0.4%의 예보율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특별기여금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저축은행 예보율은 0.5%라는 게 오 대표 주장이다.
그는 “중앙회가 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당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해야할 것은 해야 하지만, 내부적으로 한목소리로 내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회가 운영하는 각종 예치금(7~8조원) 수익률을 전문가 제도를 추진해 0.1%만 개선해도 연 80~90억원의 수익을 올려 회원사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고 했다.

![[속보]한동훈 “대통령 탈당 다시 요구…제가 책임지고 사태 수습”](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500368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