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들린 말은 순간 귀를 의심케 했다. 예비 의사를 길러 내는 학교보다는 광화문 광장이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자주 들릴 법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치열하게 샅바싸움을 벌인 여파가 졸업식에도 스며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의대 졸업식은 6년간의 고단한 과정을 이겨낸 졸업생들의 수고를 격려했어야 할 자리다. 예비 의사로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직업의식을 되돌아 볼 자리이기도 했다. ‘위엄으로써 의술을 베풀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의대 졸업식에서 되새기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런 자리에서 들려오는 편 가르기 언어가 우려됐다. 말과 생각은 누군가의 삶에 깊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누군가가 건넨 따뜻한 위로 한 마디에 다시 살아볼 결심을 하는 것도, 댓글과 같은 차가운 말 한마디에 생을 이별할 결심을 하는 것도 사람이어서다.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눈높이로 다가가 병을 낫게 할 수 있을 가란 생각을 해보기도 쉽지 않은 때 진영 간의 편 가르기를 띈 언어부터 알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들었다. 대다수가 흘려 듣는 말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가슴에 콕 박혀 집단 이기주의를 내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서다.
다행히 이날 졸업식에서 작은 희망을 찾을 수 있기도 했다. 한쪽 견해를 대변하는 언어가 난무하는 중에서도 의사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말이 들려와서다. 이 대학 의대학장은 졸업생 133명에게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의 혜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점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직업으로서 사회적인 책무성을 강조했다. 예비 의사인 졸업생들과 그간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가족·친지들도 학장의 발언 뒤에 손뼉을 치며 동의의 뜻을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와 의료계도 사회적 책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결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양쪽의 책임성은 다르지 않아서다. 나와 우리, 공동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와 의료계라면 직무유기나 다름없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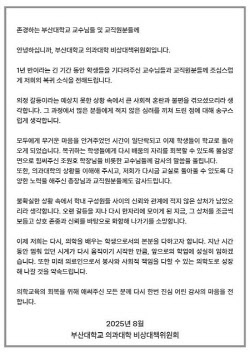

![러시아가 누리호 엔진 줬다?”...왜곡된 쇼츠에 가려진 한국형 발사체의 진실[팩트체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301228t.jpg)

![살인 미수범에 평생 장애...“1억 공탁” 징역 27년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4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