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중에는 김씨처럼 높은 연봉을 받는 월급쟁이도 있지만, 개업 의사나 변호사, 대형 식당이나 부동산 임대업자 등 자영업자도 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수입이 일정치 않은 전문직 종사자도 많다.
이들 역시 버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하지만,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국세청이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월급쟁이의 근로소득은 대부분 원천징수되는 데 비해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을 직접 신고 하면서 카드 등이 아닌 현금 거래로 벌어들인 소득을 누락해 실제보다 낮춰 신고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비용을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소득 규모를 줄이는 편법도 사용한다.
실제 2015년 국세청이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960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신고한 총소득은 1조5585억원이었으나, 세무조사 결과 새롭게 드러난 소득은 1조1741억원에 달했다. 정상적으로 신고됐어야 할 소득 대비 세무조사로 추가로 밝혀진 소득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적출률은 43.0%에 달했다.
소득 적출률이 높다는 것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철저히 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신고하지 않고 숨긴 소득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직장인들의 세금은 국세청에서 대부분 파악하고 있다.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의 특성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받은 급여 등을 통칭하는 국민 계정상 피용자의 임금·급여는 2015년 기준 594조3383억원이었다. 같은 해 국세청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으로 잡은 총 급여는 562조5096억원이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 94.6%를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다. 직장인들을 ‘유리지갑’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더라도 결국 월급쟁이 주머니만 털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그래서 나온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등을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어느정도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앞서 앞서 박근혜 정부도 초기 지하경제 양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경제·정치 현안에 밀려 지하경제 양성화 과제는 정권 중반 이후 흐지부지됐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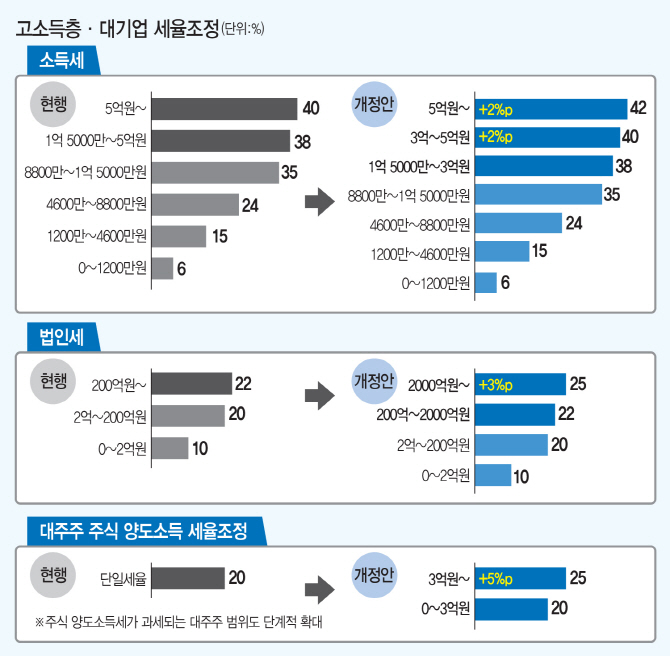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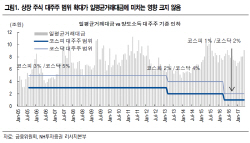


![`체포의 체`도 안 꺼냈다더니…수사는 거부하는 尹 [사사건건]](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10007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