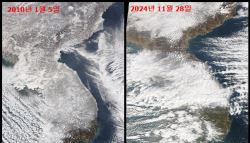|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후보 시절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그대로다. 그는 첫 임기 동안 미국 노동자들이 만든 제품을 연방기관이 구입하는 데 4000억달러(약 442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외국산이면서 미국산이라고 주장하는 허위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분야별로는 후보 시절 공약대로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친환경에너지 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 행정명령이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행정명령의 세부사항은 전해진 바가 없다.
이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WSJ은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바이든의 구상은 트럼프를 상기시킨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기조를 고집하며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무역기구(WTO)와 대립했다.
외국 정부들은 울상이다. 미국의 거대한 정부 조달 시장에서 자국 기업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게리 허프바우어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무역 상대국들은 WTO 합의에 따라 외국 기업의 미국 정부 조달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문구가 행정명령에 포함될지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
일본도 긴장 상태다. 일본 최대 광고 회사 덴쓰의 애널리스트들은 바이 아메리칸 명령이 양국 공급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에 이러한 우려를 해결할 모델이 있다고 WSJ은 전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공공사업에서 미국산 철강과 공산품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8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포함했다. 단 WTO 합의를 적용받는 조달은 예외로 했다. 당시 WTO 합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WSJ에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오바마 때와 비슷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 협정 의무에 부합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 정부회계감사원에 따르면 미 연방기관은 상품과 서비스 직접 조달 계약에 5860억달러(약 640조원)를 지출했다. 직접 조달상 외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집계돼 있다. 다만,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국내 통상환경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2050년까지 5조달러를 투자해 친환경 인프라와 관련 연구개발(R&D) 등 그린 분야를 육성,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부품,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와 배터리 등 국내 산업이 수혜업종으로 꼽힌다. 반면 미 정부의 전폭적 R&D 지원을 받은 미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면 우리 기업들의 설 자리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