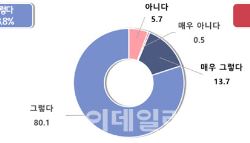|
현재 윤 당선인 측은 ‘3실 8수석’ 체제인 대통령 비서실을 ‘2실 5수석’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책실과 민정·일자리·인사수석 자리를 없애고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사이 직급으로 인사기획관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ICT 업계에선 윤 당선인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강조했고 ‘친기업’, ‘최소규제’ 방침을 내세워 기대감이 컸던 것이 사실이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아쉬움을 넘어 불안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MB 정부 당시의 전자정부에서 발전한 뭔가 하나라도 발표가 있어야 하는데, 보이는 게 없다”며 “전문가 기용을 얘기했으나, 공무원들이 더 많아지고 행정 중심의 조직에서 다시 의사결정이 이뤄질까 불안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 섞인 반응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출범 당시부터 제기됐다. 인수위에서 ‘ICT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나왔고, 뒤늦게 자문 위원 선에서 보강되기도 했다.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해선 경제1·2와 과학기술교육과 3개 분과가 관심을 보이면서, 새 정부에서 부처 주도권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역할 조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분위기다.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로도 ICT를 챙길 수 있겠지만, 예산권과 정책조정 권한이 없는 현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모델을 가져올 경우 전향적 변화가 없을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현 정부에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플랫폼을 소관하면서, 업계에선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이냐’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업계에선 ‘지금처럼 무(無)관심이 좋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들린다. 정부가 관심을 가질수록, 규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인수위에 ICT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그러면 디지털플랫폼 TF에 전문가가 들어가겠거니 예상했지만, 그게 디지털플랫폼 ‘정부’ TF였다”면서 “현재의 정부24를 발전시키는 것이지, ICT와는 관련이 없던 것”이라며 대통령실 직제가 예상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지금 같은 무관심이라면, 규제도 없지 않겠느냐”라며 아쉬운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