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중국 당국이 외국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국내에서 비디오스트리밍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자 미국 등 서방 미디어업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바로 `브랜드 버리기` 전략이다.
외국 미디어기업이 중국에서 온라인 및 케이블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스트리밍서비스 사업권을 가진 중국 파트너사를 끼고 사업을 하는 것이 필수가 되고 있다고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파트너들의 중요성이 커지자 새로운 브랜드 선택과 수익 배분 등 중국 기업에 넘기는 권한 정도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외국 미디어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온라인이나 케이블을 통한 동영상 제공 사업권을 딸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동영상 서비스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는 최근 들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애플이 최근 중국 당국으로부터 E-Book 서비스 및 온라인 영화 서비스 제공을 금지 당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내부 소식통은 WSJ에 “애플이 컨텐츠를 당국의 사업권 허가 없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려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애플도 중국 파트너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이에 대해 “E-book과 영화 서비스가 중국 고객들에게 빠른 시일내 다시 서비스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추가 언급은 꺼렸다.
`브랜드 버리기` 전략의 선두주자 중 한 곳은 미국 유료 TV 컨텐츠 제공사업자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이다. 지난 2014년 중국 국영기업인 `화슈 디지털 TV 미디어 그룹`과 손잡고 기존 디스커버리 동영상을 제공하면서도 디스커버리 브랜드 대신 중국어로 `손님`을 뜻하는 `Qiu Suo`라는 브랜드 채널을 만들어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미디어 관계자들은 “중국에서 비디오스트리밍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버리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미디어제국 디즈니의 스포츠 컨텐츠 브랜드 ESPN도 중국 인터넷업체 텐센트홀딩스와 손잡고 텐센트 스포츠포털 등 텐센트 플랫폼을 통해 동영상을 제공한다. ESPN은 사용자 데이터와 페이지뷰 등의 정보는 얻지만 광고 수입은 고스란히 텐센트가 가져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유료 구독 감소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ESPN에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의 유료 온라인 구독은 작년 264%나 늘어 2800만명에 달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미국 미디어기업들이 브랜드를 버리는 전략에 대해 씁쓸함을 표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한 미디어업체 경영진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브랜드까지 버리는 전략에 정말 충격 받았다”면서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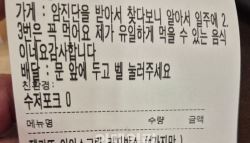

![아파트에서 숨진 트로트 여가수…범인은 전 남자친구였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3000001t.jpg)